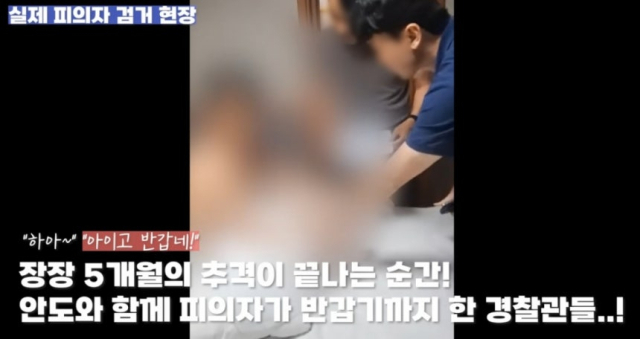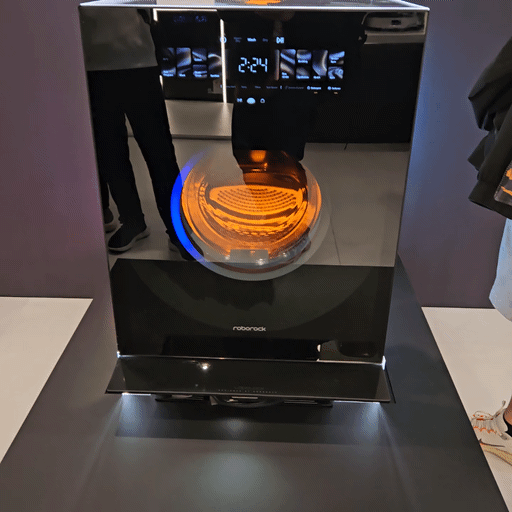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문 근처의 몽실음악사 입구에는 20년은 족히 넘은 듯한 스피커가 쌓여있었다. 음악사 옆에는 중고 자전거를 팔고 금이빨을 사며, 밤을 깎아준다는 현수막도 붙었다. 인근 옷 가게의 주력 상품은 속칭 ‘몸빼(일바지)’였다. 두 상점이 들어선 건물에는 토종브랜드 ‘쌈지’ 간판이 걸렸다. 한때 인기였지만 이제는 소유주조차 불분명한 브랜드가 이 도시에서는 여전히 ‘명품’ 대우를 받는 듯했다.
이틀 뒤인 8일 정오 무렵 안성맞춤시장 칼국수 골목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5곳은 감칠맛 강한 멸칫국물에 푸짐한 양 덕에 인근 주민은 물론 한경대 학생까지 단골이 많다. 배를 채운 시민들은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디저트와 생필품을 샀다.
안성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뉜다. 상인회는 각기 다르지만 둘은 운명공동체와 같다. 안성장(場)은 원래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며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할 만큼 명성이 높았다. 21세기 초만 해도 성남 모란장, 용인 중앙시장 못잖게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140여 개 점포가 들어선 안성맞춤시장의 점포당 월 매출은 300만 원대. 하루 평균 방문객도 1500명에 그친다.
안성시는 옛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도비 포함 수십억 원을 들여 오래된 통행로 보수, 벽화사업,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청년몰 조성 등 시설 개선 사업을 벌였다. 히트상품인 칼국수 골목 주변을 추억 돋는 복고풍으로 새롭게 꾸민 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에 마련한 ‘장마당축제’를 통해서는 평소보다 10배 많은 1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일부는 이러한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고세영(53)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고개를 젓는다. 4년 전 어머니가 국밥 장사를 하던 자리에 패션 멀티숍 ‘마카로니웨스턴’을 차린 그는 대를 이어 시장 전통의 일원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이 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부터 월 매출이 20~30% 늘었다고도 했다. 현금 장사만 하던 노점상도 쿠폰을 받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공실인 2층 공간은 한경대 학생들에게 연구 공간으로 무상 임대하고 있다.
인근 대형마트와도 상생하자는 게 상인회장의 생각이다. 스타필드 안성과 협업을 통해 젊은 요리사의 먹거리를 선보이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수많은 상권이 명멸하는 긴 세월 속에서 거저 살아남은 전통시장은 없다”며 “안성시장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수백 년 역사 문화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ds1105@sedaily.com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