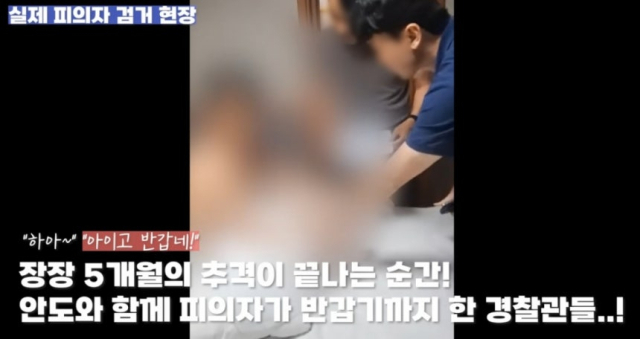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입지와 낙후된 주변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9·7 대책이 서울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만 4820호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4.3% △2025년 5.2%로 점차 증가했다. 실제 평택고덕 신도시의 한 임대주택의 경우 1600 가구 중 291가구가 공실로 남아 미임대율은 18.2%를 기록했다.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최근 5년간 3289억 원에 달했다. 임대료 손실은 연간 기준 2024년 처음으로 700억 원을 돌파 후 올해도 7월까지 벌써 600억 원을 돌파해 손실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뼈대로 세워 놓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 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LH가 보유한 공공 택지에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이 중 상당수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비중도 늘렸다.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내년 임대주택 융자와 출자액은 각각 14조 4584억 원, 8조 3274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각각 15.9%, 182.4% 증가했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가 받는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올해 1조 4716억 원에서 내년 4270억 원으로 71%나 감소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주택 융자를 줄여서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단순 양적 확대보다는 입지와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자산 요건 완화도 필수적이다. LH의 국민임대 주택 요건에 따르면 전용 60㎡ 미만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533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600만 원 이하다. 또 토지와 건물 등을 합산해 3억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면 임대주택 청약에 나설 수 없다. 수입차 보유로 인해 차량 기준가액 3800만 원을 넘어선 경우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공고 시점 기준에 소득 요건을 맞추려고 부부 중 한 명이 일부러 입주 이후로 취업을 미루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득·자산 요건 등이 한정된 재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건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