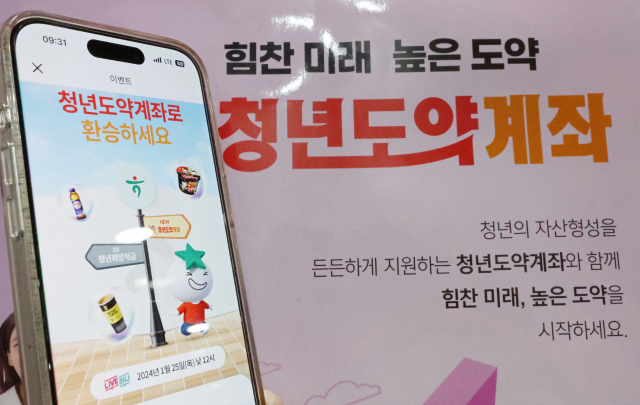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표로 연 9%대 적금 효과까지 적용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적금 중도 해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취업은 힘든데 생활비는 자꾸 올라…중도포기율 급증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이다. 업계는 청년층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이 같은 증가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실업 또는 소득 감소’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같은 조사에서 ‘생활비 상승’을 사유로 지목한 비율 역시 49.9%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결국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자 중장기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한다. 만기 시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 최대 연 9.5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이 지지부진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행 6개월인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1만명으로 예상(306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 역시 220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286만8000명)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편성한 3440억원 중 3008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지난해 역시 집행액이 2843억원에 그쳐 2023~2024년 누적 유보금만 3194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올해를 끝으로 운영 종료…실질적 경제 사정 반영해야
한편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종료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인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역시 청년층의 ‘생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사정에 기반한 목표부터 개선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정책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실적에 따라 기여금이 집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출연금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