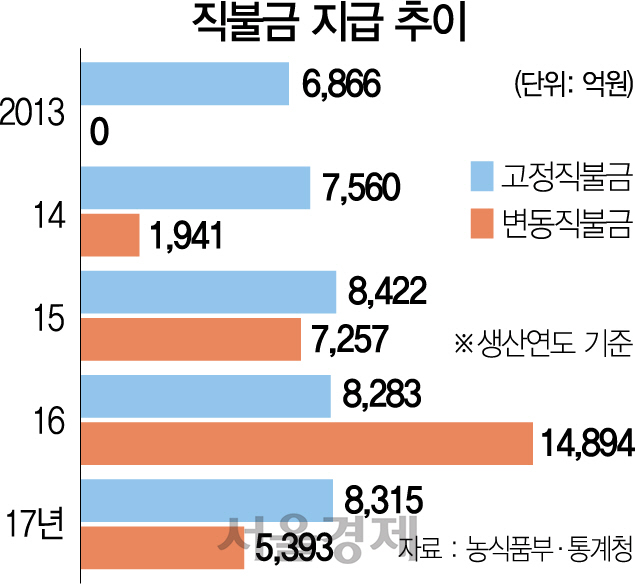쌀 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공급과잉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쌀을 ‘성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쌀 농가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08년 207.7g에서 지난해 167.3g으로 감소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밥 한 공기 반만 먹는 셈이다. ‘주식은 밥’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다.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쌀 시장을 개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번번이 무산됐다. ‘농심(農心)이 곧 표심(票心)’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위세가 컸던 탓에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그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다. 쌀 관세율 상한선 설정 등을 논의했던 2005년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두고 반발은 특히 거셌다. 한국 농민단체 700여명이 홍콩 경찰과 무력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을 정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쌀 개방이 오르내린 탓에 집권당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는 WTO에서 농업 분야만 예외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키며 수입쌀에 513%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1㎏당 1,000원의 수입쌀을 국내에서는 6,130원에 판매한다는 의미다. 국내 농가의 쌀 가격 경쟁력을 지켜주기 위한 대가는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남았다. 2015년부터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농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쌀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나라 농업예산의 40%는 쌀에 투입되고 1조4,900억원에 이르는 연간 농업보조금 총액도 대부분 쌀 보조금으로 쓰인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농업의 특수성이 있지만 이제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식량안보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