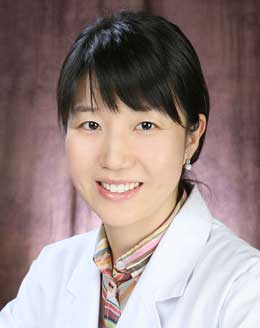|
최근 한 편의 영화가 사회 곳곳에 울림을 주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장애인 인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떨까. 전문적 기관이 여럿 설립돼 있고 몇몇 개인치과에서 진료를 하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고 치아 건강은 안 좋다. 가장 큰 이유는 치아가 다른 전신 질환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치료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또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도 쉽지 않은데다 의사소통도 힘들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구강관리 교육에 대한 쉽고 충분한 설명이다. 비장애인에게는 양치질이 가장 손쉬운 구강관리법이지만 손을 쓰기 어렵거나 입을 벌리는 것이 힘든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보호자가 억지로 양치질을 시키는 것도 만만찮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미세한 손동작이 힘들다면 진동칫솔을 이용해 양치하면 된다. 만약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힘들다면 개구기 등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좋다. 또 간단하지만 식사 이후 가볍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입안을 매번 씻어주게 돼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둘째,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다.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구강상태가 심하게 나빠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않다. 불편한 치아가 있어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 가벼운 충치로 시작한 것이 결국엔 치아를 빼는 상황까지 간다. 이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협조가 있어야 풀 수 있다. 식사할 때 먹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얼굴 또는 입안을 못 만지게 한다면 치과 검진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치료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령 마취를 한 경우 자칫 감각이 둔해 점막을 씹거나 상처가 날 수 있다. 또 발치 이후 거즈로 약 2시간 정도 압박해야 하는데 장시간 물고 있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료방법 자체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치료 전 준비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환자의 전신 질환에 대해 평가하고 마취방법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치과 치료 도중 입을 벌리지 못하거나 저항할 경우 환자의 안정을 위해 깊은 진정이나 전신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치과 치료는 치과대학병원 부설 장애인 특수클리닉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 진료를 하는 곳도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진료와 치료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다. 사회가 장애인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상처 입은 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살아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