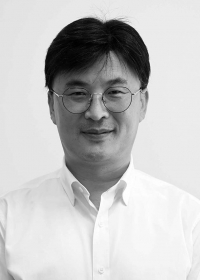1945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은 곧바로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일본을 통치한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15개 대기업집단, 즉 일본 재벌의 해체다. 명분은 경제민주화였지만 속내는 달랐다.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미쓰이·스미모토·미쓰비시·야스다로 대표 되는 일본의 대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 급성장했다. 사업 영역도 넓었다. 항공모함부터 전투기 등 각종 전쟁 전략물자도 양산했다. 미국이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대기업 해체에 주력했던 진짜 이유다.
미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거침없이 제거하곤 했다. 다른 나라의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 군정은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졌다. 농업만 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미국의 전략에도 변화가 온다. 일본의 군수산업이 필요했다. 대기업은 해체됐지만 일본에는 생산시설과 기술 전문 인력이 그대로 있었다.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최적이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 틈을 타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실력자로 부활했다.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일본 기업의 독주를 제2의 진주만 침공으로 본 미국은 1980년대 중반 플라자합의와 반도체협정 등을 통해 일본 산업을 다시 주저앉힌다. 경제안보는 늘 미국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였다.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경제를 넘어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판단했다. 헤게모니가 변곡점에 설 때는 그 대상과 영역·국가를 미국이 선택했다.
이런 시각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의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기업집단을 향한 시각이 특히 그렇다. 해체·개혁의 대상이 됐다. 미국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투영하면 이런 프레임은 누구에게 유리했을까. 한국의 대기업집단, 즉 재벌은 많은 부작용도 양산했지만 경쟁 국가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철강부터 조선·중공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까지 그룹의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추월해갔다. 산업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선진국의 눈에는 불공정한 게임으로밖에 안보였을 게다.
정상의 기업이라면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10년, 15년 이상 길게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사막에서 우물 찾기와도 같아서다.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그것을 감행했다. 물을 찾고 과실까지 땄다. 자동차·반도체 등 11대 수출 업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경쟁 국가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무늬만’ 공정 경쟁인 글로벌 시장인데도, 이들은 짧게 잡아 20세기 초부터 그런 불공정을 일삼아왔으면서도 한국 대기업을 불공정 게임의 화신으로 봤다. 외환위기는 대기업집단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약속이나 한 듯 ‘재벌 개혁’ 등 한국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감시도 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을 일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의도는 달랐다. 발을 묶고 팔을 비틀어 경쟁 대열에서 밀어내야 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대기업 해체·견제의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됐다. 대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차별 규제의 시작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규제가 있다. 103개는 만든 지 20년도 더 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고 급기야 글로벌 경쟁사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현대차와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이유다.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왔다. 오죽하면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까지 냈겠는가. 대기업으로의 진입이 빠르게 늘지 않으니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대학 입시 경쟁 과열 △사회적 이동성 저하 △출산율 하락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야를 넓혀야 이용당하지 않는다. 기업을 국내 경제의 좁은 관점으로만 봐서는 판세를 읽을 수 없다. 한국 땅에서 두던 바둑은 이제 그만하고 그 무대를 세계의 지도로 옮겨라. 기업 규제도 그 지점에서 ‘리셋’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