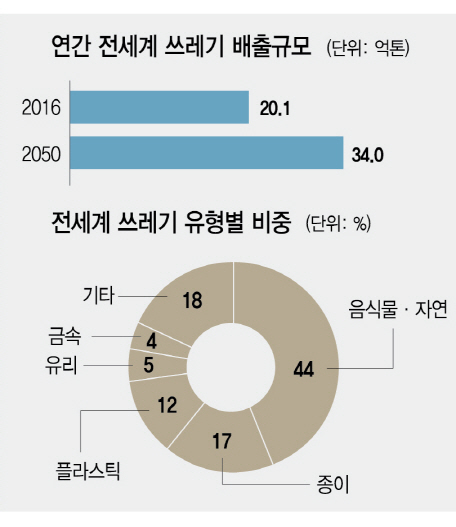지난해 7월 미국 환경단체 ‘포트모건셰어더비치’는 접이식 의자에 달린 끈에 목이 졸려 죽은 채 해변에 떠밀려온 바다거북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뒤집힌 거북의 목에 난 깊은 상처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세계인은 북극에서 전해진 사진 한 장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먹이를 찾으러 나온 북극곰은 검은 플라스틱을 물어뜯고 비닐봉지를 뒤지고 있었다. 지구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뱃속에서 20㎝ 크기의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되는 등 국내 여건도 다르지 않다.
바다 위의 플라스틱은 북태평양 해상에 한반도의 7배가 넘는 155만㎢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형성하는가 하면 해양 생물의 몸속을 파고들어 생태계를 파괴한다. 한국환경공단의 2014년 자료를 보면 해양 평방마일마다 플라스틱 4만6,000조각이 들어 있고 매년 적어도 1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상어, 거북이, 돌고래 등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 다도해도 쓰레기로 몸살=우리나라도 폐기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남도는 홍어 뱃속에 폐비닐이 가득하고 바다거북 사체에서 폐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양쓰레기 전담반을 구성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라남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보면 전남 해역에 연간 1만8,000톤에서 3만5,000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8만7,0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들 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중국 등 외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신안·고흥 등지에 있는 무인도의 쓰레기만 4,120톤에 달한다. 한반도의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전라도뿐 아니다. 해양환경공단이 2013년 발표한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매년 17만6,807톤의 쓰레기가 서해·남해·동해 등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4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쓰레기의 56.5%는 플라스틱이었고 스티로폼(14.4%)이 뒤를 이었다.
◇사라지는 나무, 넘치는 온실가스=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17년 캠페인에서 해외 연구를 인용, 매년 150억그루의 나무가 줄어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는 2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목의 42%가 종이 원료인 펄프로 사용되는데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은 나무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한 해 166억개의 종이컵을 쓰면서 베는 나무는 1,500여만그루에 달한다. 또 이들 종이컵을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4,700여만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문제는 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가둬둘 곳이 사라지며 지구 온난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우리 국민이 1인당 종이컵 사용을 1개씩 줄일 경우 하루 35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최초로 실시한 온실가스 경매에서 톤당 가격 2만5,500원을 적용하면 892만원 상당으로 연간 32억6,000만원어치다. 종이뿐만 아니라 석유에서 비롯된 비닐도 1톤 제작 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무 1,100여그루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땅에 묻어도 500년 가까이 썩지 않고 소각 시 유해물질도 배출된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이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