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수업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늘면서 공교육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학생이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2년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관련 통계도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ADHD 환자 수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만 5∼14세 아동의 ADHD 환자 수는 2022년 7만 3000여 명에서 2024년 11만 4000여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6% 이상 급증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 A씨는 "10년 전만 해도 한 학년에 한두 명 보일까 말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반에 한두 명꼴로 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다른 학생을 지도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13년 차 초등교사 B씨 역시 "해가 갈수록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진다"면서 "20~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들조차 '아이들의 수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수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판단해 전문가 상담이나 의료기관 연계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려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끝내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이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면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교내 상담실 이용을 권유하는 것조차 극도로 부담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사들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및 협조'를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3월 서울 소재 초등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 행동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58.5%가 '가정과의 협조'라고 답했다. 또한 '문제 행동 지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응답자의 66.9%가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선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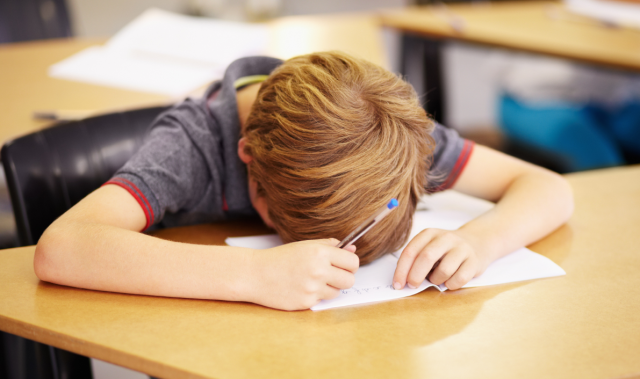
 lia@sedaily.com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