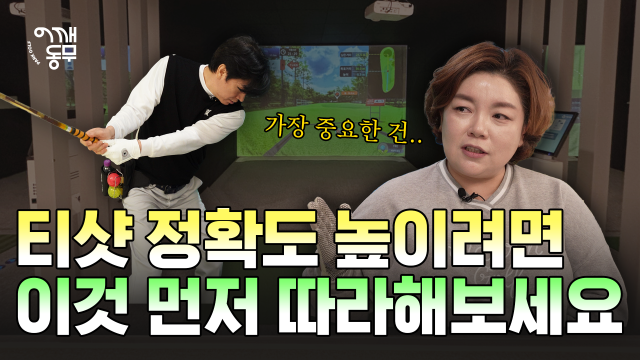“망할 건설사는 망할 때가 됐죠. 또 살려주면 시공사 신용보강에 기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하는 기이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건설·개발 업계에서 이 같은 양심선언이 부쩍 자주 들린다. 4~5년 전 저금리 기조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이 급성장했을 때 건설사·디벨로퍼들은 너도나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쳤다. 현재의 연이은 건설사 도산은 일차적으로는 급등한 공사비 때문이지만 과거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고위 당국자들이 줄곧 “모든 건설사를 살릴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문제는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5%에 이른다. 산업 기반이 약한 지방 경제에서 건설업의 역할은 더 크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와 건설경기 침체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시장 건전화와 지방 경기 회복이라는 두 과제 사이에 놓인 정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업계는 주택 매수 수요 진작에 필요한 양도세·취득세 완화를 요구했지만 가계부채 관리 목표 때문에 세제 혜택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신 공공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5년 만에 매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사에 8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장 건전화와 지방 경기 회복을 동시에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지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업계의 사업 관행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지방 주택을 살 수 있고, 건설사도 안 팔릴 곳에 건물 지어 놓고 정부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정책에 지방 철도 지하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기 목표를 담았다. PF 자기자본 확충 및 책임준공 의무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는 묘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