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성향을 올린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두고 하는 소리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 증시에 도입한 지 만 1년이 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진행했지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표에 맞는 결과물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을 참고했음에도 한국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 두 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행 과정이다. 일본은 2013년 아베노믹스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를 합병하면서 5개의 시장을 3개로 줄이는 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이후 상장 및 퇴출 제도를 손보고 후속 조치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은 어떤가. 공시를 통해 배당성향 강화, 자기자본이익률(ROE) 상향 등 앞으로의 밸류업을 위한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10년에 걸친 증시 개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를 한국은 밸류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내세웠다. 정부와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1년 만에 상장 및 퇴출 규제 강화에 나서며 시장 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정책인 시장구조 개편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을 먼저 도입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저 다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거버넌스 코드 등 친기업 정책을 함께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이 이제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준이다. 기업이 경영하기 힘든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당근이 선행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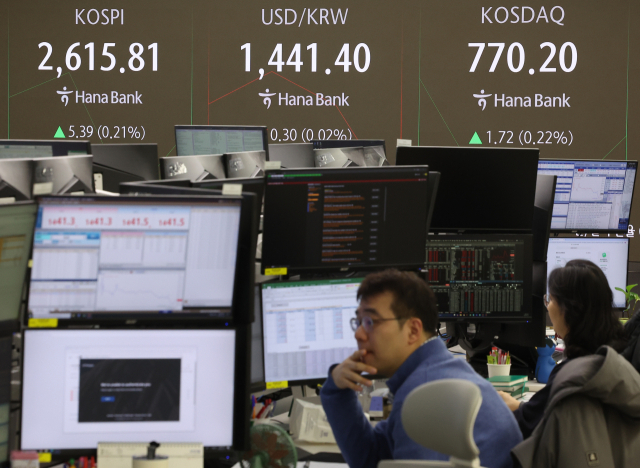

 kate@sedaily.com
kat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