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에는 전 세계가 녹아 있다. 미국의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에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생산한 부품이 더해지고, 중국의 저임금(조립) 노동력을 거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일국 차원에 기초한 생산 체제로는 더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신간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은 생산의 세계화가 국민 경제에 초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미국·일본·독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새로운 국민 경제의 재조직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과거엔 각 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국민 경제의 핵심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의 세계화, 글로벌 차원의 경쟁 속에 국가의 대표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자기 생산 방식을 재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자기 생존을 위해 생산을 세계화함에 따라 이들 기업과 국민 경제의 전체 이익 간엔 긴장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1990년대 이후 해외 생산을 늘리는 사이 미국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의 2008년 현재 1998년의 66.7%까지 쪼그라들었다. 저자는 미국처럼 주요 기업의 세계화로 국내 산업의 역량이 약화한 사례는 물론이요, 해외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수립해 자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한 독일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며 무엇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한다. 예컨대 독일 기업의 생산 세계화 과정에는 노조와 산업 협회, 지역 단체 등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다고 이 모델이 모든 국가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경우 세계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만 7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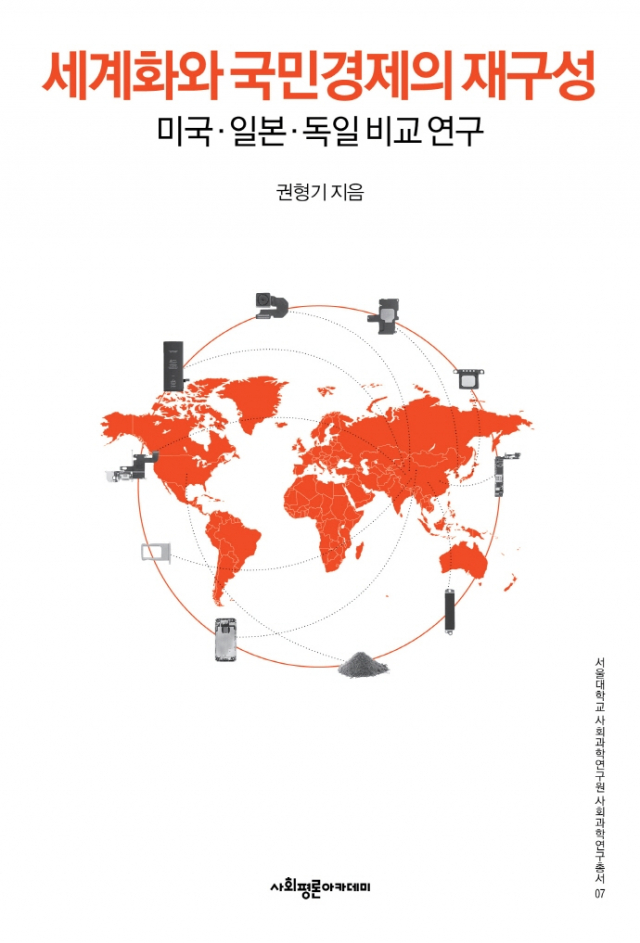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