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다시 만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디지털로 되살리는 기술은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AI 스타트업 ‘투웨이(2Wai)’는 단 3분짜리 영상을 기반으로 고인을 AI 아바타로 재현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며 최근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임산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AI 아바타와 대화한다. 시간이 흐르자 아바타는 태어난 손자를 보며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소통을 이어간다. 회사는 “3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인을 일종의 ‘디지털 존재’로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차갑다.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아이디어”, “누군가의 슬픔을 수익 모델로 이용한다”, “죽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든 캐릭터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짧은 영상만으로 고인의 성격·감정·가치관을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생전 동의 없이 ‘영생’이 가능해지는 기술이 상업적 상품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크다.
반면 한국에서 이뤄진 비슷한 기술 활용 사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의 생전 목소리를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복원해 부모에게 전달했다. 한두 문장만으로도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최신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성편지는 순직 소방관 부모을 위한 ‘마음치유 여행’ 과정에서 공개됐다. 비행기 안에서 흘러나온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부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고, 소방청 공식 유튜브에는 “기술의 순기능”, “고마움이 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술 자체는 비슷하지만, 받아들이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상업적 서비스로 고인을 무한정 ‘재생산’하는 것과, 유가족 동의 아래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복원해 위로와 추모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적 고인 아바타는 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와 다른 성격을 덧씌우는 ‘2차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란이 거세다.
AI 기술이 죽음을 넘어 고인을 ‘불러오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는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고인의 디지털 초상권·동의권·인격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디까지가 위로이고 어디부터가 착취인지 기준은 아직 없다. 기술은 이미 가능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두 사례는 같은 기술도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착취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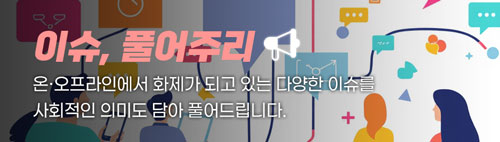
 lia@sedaily.com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