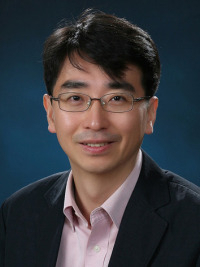올해 7월 중순 ‘크립토 위크’ 기간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점과 발행 주체 등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지난 5년간 수익률 1000%를 상회하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새로운 가상화폐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해다.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지만 그에 상응하게 높은 변동성을 보여 거래 수단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에 대응해 가치 안정성을 목표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안정적인 것은 발행할 때 발행량에 상응하는 현금, 은행 예금, 국채, 지방채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환매 요청 시 준비자산을 처분해 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테더(USDT)와 서클(USDC)은 투자자의 환매 요청 시 미국 1달러와 교환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이 2017년 7.9%에 불과했지만 올해 84%로 성장했다. 미국 달러와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도 2020년 56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238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선진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일반적인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자본 규제 등이 심한 국가에서 국경을 넘는 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시장 밖에서도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튀르키예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해 지난해에만 631억 달러 규모의 국가 간 거래에 사용했다. 역시 고인플레 국가인 레바논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했다. 인권 단체들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의 회사들도 아시아의 공급처와 거래할 때 쓴다고 한다. 거래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성을 인지한 카드사와 핀테크 업체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거래 가격이 특정 법정화폐에 항상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더의 거래 가격은 미국 1달러와 평균 54bp(1bp=0.01%포인트) 괴리가 있었다. USDC는 평균 1bp 정도의 괴리를 보였지만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 상태에 이른 당시에는 0.88달러까지 거래 가격이 급락했다가 미국 정부의 개입과 발행사 서클의 대응으로 1달러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거래가격이 약속한 법정화폐 금액보다 낮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청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코인런 상황에서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처분해 대응하려 하겠지만 비상 시에는 채권 등의 준비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인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발행사가 파산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거래수단으로 역할을 할 때 코인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게 돼 경제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밍 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코인런 발생 가능성은 상충 관계가 있고, 미국 달러와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가격이 미국 1달러와 괴리가 적은 스테이블코인의 코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과도하게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코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 당국이 상충 관계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험을 잘 인지해 규제와 제도를 신중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