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관리·전문직이면 자녀도 관리·전문직이 돼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선 최근 ‘남성 대졸·여성 대학원 졸업’ 혼인이 늘어나며 ‘남성 상향혼’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자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를 둘수록 자녀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50~60년대생에 비해 1970~80년대생들은 부모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일수록 자신들도 이와 비슷한 관리·전문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보고서는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노동패널 등을 이용해 실증 분석했다.
취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간 직업 지위에 대한 세대간 이동은 상위 직업군 및 하위 직업군을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비슷한 학력끼지 혼인하는 동질혼 비중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모의 학력수준보다 본인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1970년대생보다 1980년대생에서 남자의 학력 기준 상향혼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대학 졸업-여성 대학원 졸업 혼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은 이들 직군 비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세대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이전만큼 유효하지 않다고 밝힌다.
이밖에 부모의 순자산이 많으면 전세금과 집값 등 자녀의 주거자산 및 자녀의 5년, 10년 후 순자산도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부모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가 분가할 시 주거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다만 과거보다 최근 그 영향력이 다소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자가 주택 자산을 가질수록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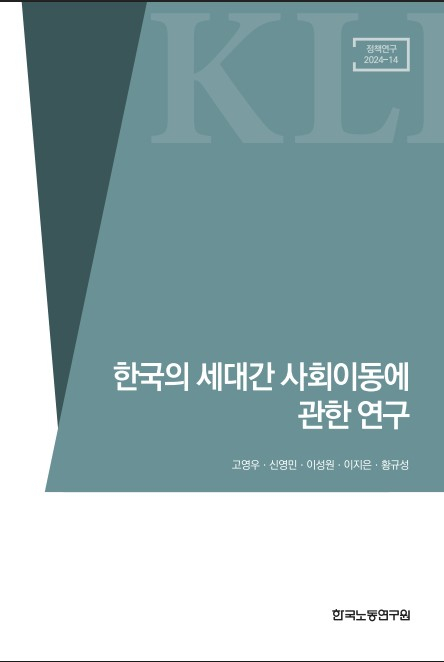
 greenlight@sedaily.com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