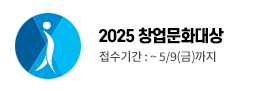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2월에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3월에 각 대학이 정원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입시 요강 확정과 5월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의대생들이 3월에 복학하지 않고 2년 연속 휴학한다면 의료 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하고 대화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내년 의대 정원 제로’를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협과 전공의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지난해 9월 여야의정(與野醫政)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를 기다리면 의료 공백 문제는 더 깊어지고 의정 갈등의 상처는 회복 불능 상태로 악화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과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부 측과 원점에서 협의해 필요한 의료 인력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속히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