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조 지형을 양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10명 중 6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4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파업으로 대표되는 투쟁이 본류인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할지 고민이 깊어질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연 정책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9월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조합원 7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설문을 보면, 조합원 스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 보다 높지만, 격차가 크기 않은 문항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노총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67.1%로 ‘못한다’(32.9%) 보다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민주노총 호감과 신뢰도에 대해 56.6%는 ‘낮다’고 답해 ‘높다’(43.4%)를 앞섰다.
특히 민주노총 투쟁의 효과에 대해 ‘효과적이다’는 답변도 59.2%로 반대 답변(40.8%)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투쟁의 수단으로 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도 68%는 ‘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군사독재에 맞서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물로 창립했다는 점에서 이런 답변은 뼈아픈 대목이다. 노동단체 영향력이 조합원 규모와 국민적 공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수는 13년 만에 줄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제 1노총 자리를 다투던 민주노총은 3년 연속 2위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투쟁인 총파업에 대해서는 이미 관성적이 됐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2021년 민주노총이 연 총파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됐다’ , ‘투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늘 선결 요구조건으로 내건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간 엇갈린 답변이 나왔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천천히,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빨리 올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80%가 동의했다. 우리나라 노조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공공부문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스스로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의 양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동일 수준 임금에 대해 75.3%가 동의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58.4%만 동의했다. 민주노총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사회연대사업에서도 소수자 인권 옹호, 젠더 불평등 극복을 꼽은 비율이 5% 미만에 그쳤다.
일련의 상황은 조합원 스스로 민주노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 민주노총의 의결구조, 집회 운영, 간부 관료화, 조합원 의견 반영에 대해 긍정 답변은 평균 50~60%로 반대 답변을 압도하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책대회 개막식에서 “우리는 권력이 정리해고를 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막아내는 투쟁을 하는데만 급급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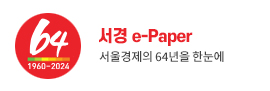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