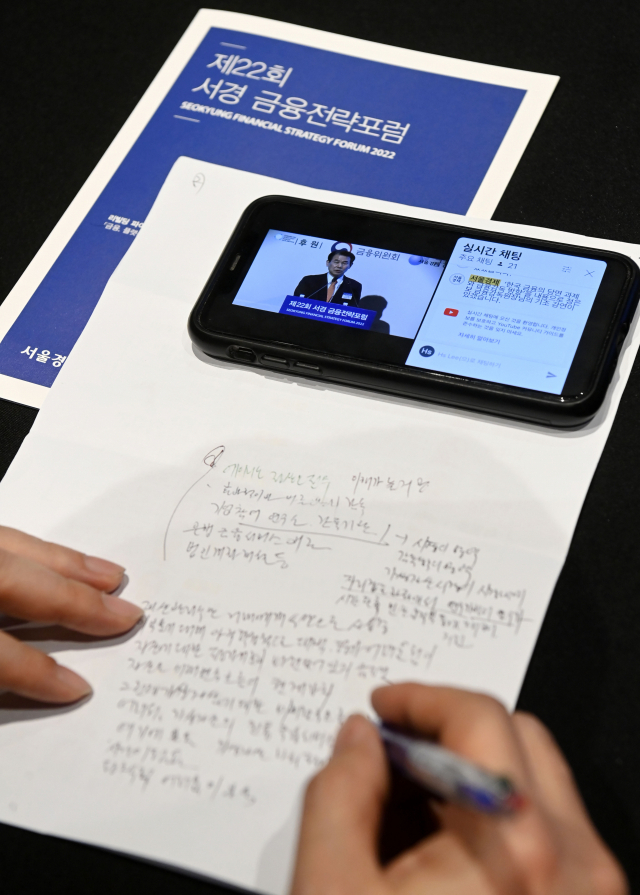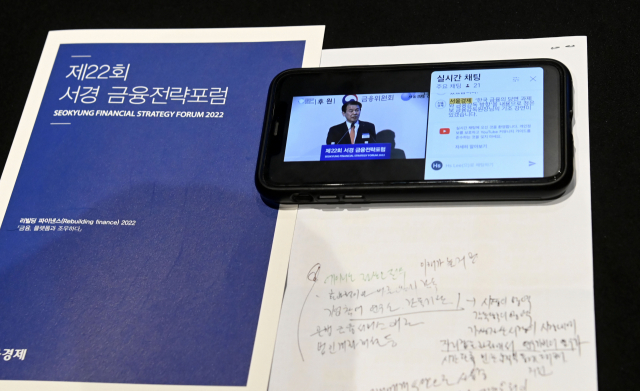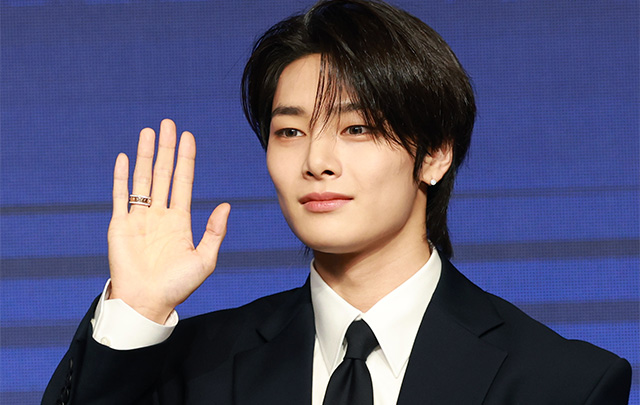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에 대한 현재 기조(프레임워크)를 당분간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중소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계기업도 많이 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만큼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금융 소비자들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라고 짚었다. 정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더 많이 높여주는 것이 좋지만 금융사들의 건전성,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현재의 DSR 프레임워크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계부채보다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도 진행되고 있다. 정 원장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도 “내수 경기의 어려움 속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유예가 부실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뤄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총인구가 줄어들고 금융 자산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금융사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본 생산성을 높이거나 질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이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도 결국 디지털화를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금융 산업이 대외적 경쟁력 유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