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치매보험 보장금액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내수시장 포화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일 킬러 콘텐츠가 없던 보험사들이 보장금액을 강화한 치매보험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경쟁을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손해율 급증에 따른 손실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초 중단됐던 치매보험 판매를 재개했다. 한화생명의 치매보험은 당초 1월 출시돼 20만명이나 가입할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높은 손해율과 중복가입 등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판매를 중단했다. 개정된 상품은 경도 치매와 중등도 치매 진단금을 각각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대신 중증 치매 간병자금을 종신지급에서 최장 15년간 연차별 차등지급으로 바꿨다. 1~2차년에는 월 100만원을, 11~15차년에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진단금과 간병자금이 기존 상품보다 늘기는 했지만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 생존확률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고객을 호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도 경증 치매 진단금을 중복가입 기준 2,000만원, 단독가입 기준 1,000만원까지 낮췄다. 여타 보험사 역시 가입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단기 실적에 급급해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팔다가 뒤늦게 손해율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먼저 가입한 고객의 보험금을 나중에 가입한 고객이 떠안게 된 셈이다. 지급 기준이 애매한 경증 치매보험 약관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과거 양로·치아 보험처럼 수년 후 보험사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임기 내 단기 실적을 내야 하는 보험사들이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분쟁을 부를 수 있는 애매한 경증 치매 진단 기준 등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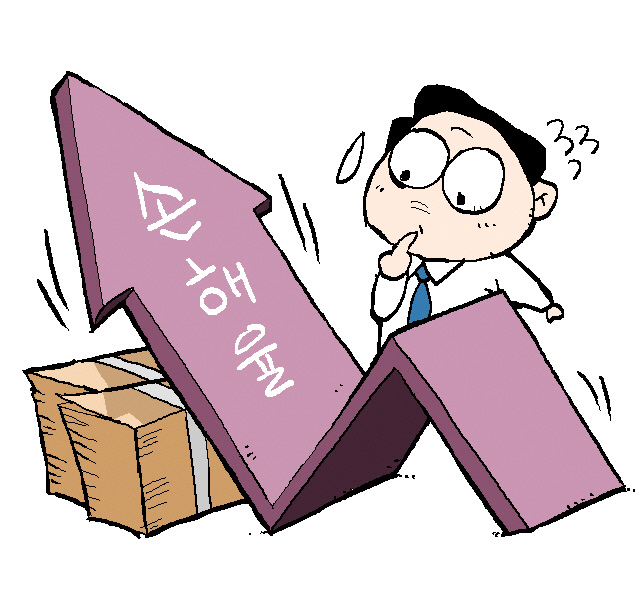
 ginger@sedaily.com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