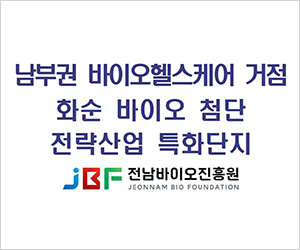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15년 1조7,400억원에서 2017년 1조8,600억원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전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앞서 강원 산불을 두고 강풍을 타고 날아온 이물질이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부딪혀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전이 산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시점은 실적 쇼크가 닥친 때와 맞물린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 2,080억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보수기간을 늘려 잡는데다 이용률이 과도하게 떨어졌고 발전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안전 예산을 줄였고 결국 강원 산불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시설 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면서 제2의 강원 산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사를 예방할 근본 대책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지중화 개폐기 1개 가격만도 일반 개폐기의 열 배 수준인 3,000만원에 달하는데다 땅을 굴착하는 비용까지 추가된다.
특히 지중화 사업 부담을 나눠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중화 사업은 대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내부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데 비용은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으로 분담한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 안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내용’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난해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63개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에 올랐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도 한전이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대도심 위주로 지중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