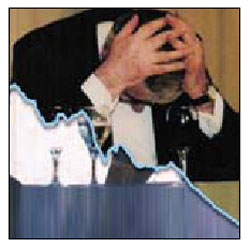|
1992년 9월16일, 영국에 비상이 걸렸다.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파운드화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10%인 금리를 하루에 두 차례나 12%, 15%로 올려도 소용없었다. 파운드화를 팔자는 주문은 그치지 않았다. 영국 재무부는 외환시장이 마감된 후 유럽환율조정체제(ERM) 탈퇴까지 선언했다. 유럽의 주요 외환시장도 대혼란을 겪었다. 영국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환율방어를 위해 날린 돈은 무려 34억파운드(요즘 가치 6조3,000억원). 영국은 왜 거액을 쏟아 부었을까. 외국자본의 동요 탓이다. 독일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통독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영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세 통화인 파운드화를 버렸다.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던 영국이 금리인상안을 만지작거릴 즈음 몰려든 국제투기세력은 영국의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 파운드 매도 공세를 펼쳤다. 결국 영국이 파운드화를 지키려고 쏟아 부은 자금은 고스란히 투기세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약 100억달러의 자금을 집중 운용했던 조지 소로스는 단숨에 10억달러의 차익을 거머쥐며 ‘환 기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로 불린 이날의 충격은 영국 경제는 물론 정치구도에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장기집권을 끝낸 보수당은 노동당에 내준 정권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통화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당시의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16년을 지난 검은 수요일은 남의 일일까. 오락가락 환율정책 속에 한국 정부가 날린 외화자금만 수백억달러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투기세력에 악용될 수 있는 공매도 제한마저 풀었다. 걱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