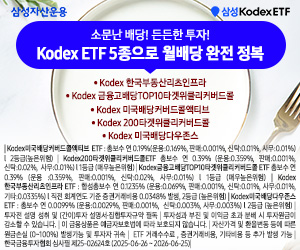루블화 반년새 50% 폭락등 환란재연 우려<br>보유외환 급감속 신용등급도 BBB로 추락<br>"루마니아등 동유럽으로 위기 확산 될수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 화려한 부활을 알렸던 러시아가 불과 1년도 안 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릴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러시아 자국 통화인 루블화가 서구 자본의 엑소더스 속에 연일 곤두박질치면서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인근 동구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마지노선인 달러당 36루블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7월 달러당 23루블대였음을 감안하면 반년새 50%가 하락한 셈이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러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만으로도 금새 무너질 만큼 취약했고, 이 참을 노린 투기 세력들은 루블화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며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부추겼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한 실탄은 총 외환보유고의 1/3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 외환 보유고 급감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이어 4일에는 피치가 디폴트(국가채무불이행)를 선언했던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내렸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빼 들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마저도 묘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알렉세이 모이세프 르네상스캐피탈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이 현 수준에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안정돼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린 시민들이 정부의 무능력에 화살을 돌리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러시아 정부는 재벌인 올리가르히를 중심으로 한 산업지원에서 은행 섹터 지원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위기가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 철회로 이어져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지난 4일 자국 통화인 텡게화에 대해 18%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럽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