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기업의 절반이 법원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폐를 앞둔 부실기업들이 인용이 극히 드문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벌면서 되레 투자자 피해만 장기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속도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소가 상폐를 의결한 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은 전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상폐 전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해당 기업들은 ‘코스닥 퇴출 심사 2심제’ 도입 이후 처음 상폐가 결정된 기업이다. 이그룹 계열사 이아이디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보류됐던 정리매매를 재개하면서 96.41%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정리매매는 상폐가 확정된 기업에 대해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7~10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 없이 주식 거래가 이뤄진다.
앞서 올해 1월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상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감사 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일 경우 즉시 상폐되도록 했다. 개선 기회는 1회로 제한됐으며 코스닥 퇴출 심사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됐다. 거래 정지 장기화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거래소가 상폐를 결정한 기업(정리매매 중인 기업 포함) 수는 총 82곳(코스피 12곳·코스닥 70곳)으로 △2023년 코스피 6곳·코스닥 37곳 △2024년 코스피 9곳·코스닥 51곳 대비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늘어난 상폐 결정만큼이나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도 증가하는 점이다. 올 들어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기업은 42곳(코스피 9곳·코스닥 33곳)으로 전체 상폐 결정 기업(82곳)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상폐 결정 기업 4곳 중 1곳이 법정으로 향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다퉈보자”는 시도지만 법원이 실제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감마누(현 오늘이엔엠)·비덴트 등이 유일한 예외다. 대형 로펌의 증권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상장 규정을 거래소와 상장사 간의 약관으로 보고 있어 상폐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등의 사유가 아니면 가처분이 인용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본안인 무효 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이 실제 인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폐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 끌기가 나타나면서 피해는 투자자에게 되레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폐가 결정된 기업 5곳(코스피 2곳·코스닥 3곳)은 지금까지도 가처분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기업들은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어 최종 상폐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만 결과적으로는 희망 고문 기간만 길어지고 손실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장기간 시장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은 그 비중이 높아 지수 상승을 제약한다”며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코스닥지수는 37%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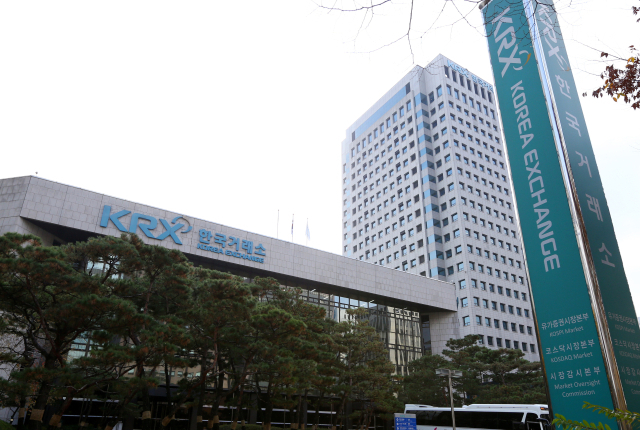

 ymjeong@sedaily.com
ym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