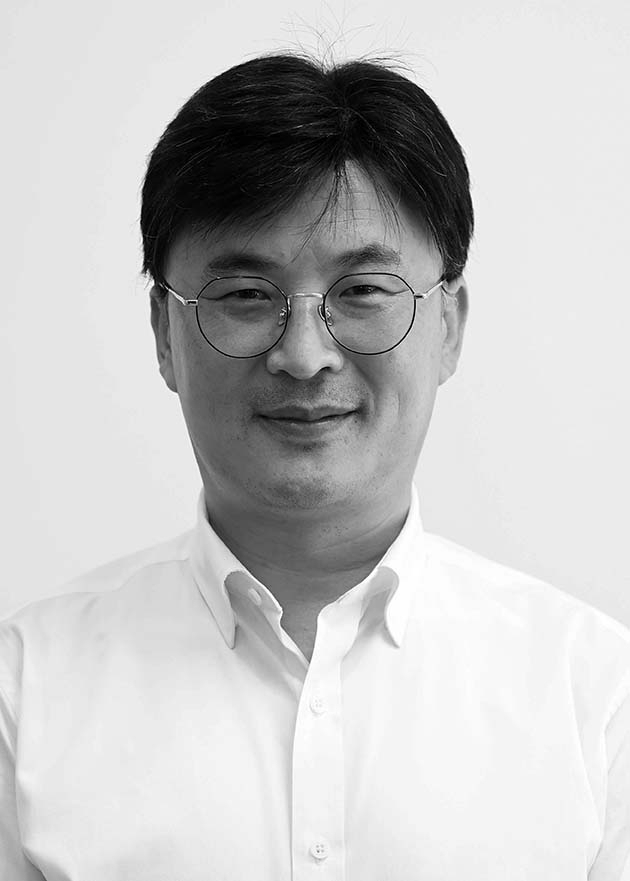2049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중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서구 패권 국가의 취약점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롱게임’의 저자 러시 도시는 그것을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불평등)·정보과잉으로 지목했다. 소위 중국의 엘리트들이 서구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설득력도 있다.
실제 정치 세력들의 표(票)를 향한 대중추수주의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미국은 물론 서구의 여러 선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한 확장하는 정보의 과잉은 또 어떤가. 걸러지지 않는 날것의 달달한 소식은 팬덤의 극단정치와 결합해 폭발력을 더해간다. 중간 지대는 점점 힘을 잃고 정치의 영역은 악다구니만 생존할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붕괴의 서막이 열린다고 보고 있는 중국은 그 약한 고리를 ‘롱게임’의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치밀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예외일까. 포퓰리즘과 갈라치는 정보 비틀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 합리적 이성은 마비되고 약속은 헌신짝이 되기 일쑤였다. 툭 던진 공약은 나라 전체를 흔들었고 수습에도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갔다.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1만 원부터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행정수도 이전, 대운하 등이 그랬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샤워실의 바보’처럼 물을 틀었다 잠갔다만을 반복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해외자원개발·종합부동산세·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매몰 비용은 또 엄청났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퍼주기는 또 어떤가. 지난 대선 때는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100만 원 지급을 경쟁하는가 하면 노인부터 유아·군인에까지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해 댔다. 나라의 곳간 사정은 관심의 영역밖이었다. 퇴임 뒤 “돈을 원 없이 써봤다”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국가 채무가 더 늘면 어떤가”라고 목청도 높인다. 잘 쓰는 데는 관심 없고 당장 시급한 표와 집토끼를 가두는 데 급급했다.
반면 미래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에는 소극적이다. 정권 출범 후 1년 넘도록 연구·토론했던 연금개혁안은 숫자도 없이 제시됐다. 나랏빚 걱정이 태산이라면서도 정작 그것을 관리할 재정준칙은 또 물 건너갈 모양새다. 원전 폐기물이 턱밑까지 다 찼는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설령 원전이 멈추더라도 ‘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다’는 것이다.
잠잠했던 그 정치공학이 최근 다시 난무하기 시작했다. 선거가 다가왔다는 얘기다. 주식 공매도의 6개월 정지 조치가 전격 단행됐다. 타이밍은 절묘했지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클 것 같다. 대선공약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4월 총선보다 덜 급했던 셈이다. 1400만 개미투자자를 향한 구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때도 이슈가 돼 이를 100억 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칼이 춤을 추면 억울하게 매를 맞는 곳도 발생한다. 기업이다. 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은 반면 표심을 겨냥한 민생은 내세울 수 있다. 난데없이 기업 ‘횡재세’의 목소리가 커지고 노란봉투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요금은 대기업에만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뿐인가. “이자로 60조 원 번 은행권이 삼성전자·현대차만큼 혁신했나”라면서 금융 당국 수장이 몰아세우자 은행들은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내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그 돈은 땅 짚고 헤엄쳐 벌었다고 비판받는다. 고용도, 곳간을 채우는 법인세도 선거공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중국이 포퓰리즘을 서구의 약한 고리로 지목할 정도로 부작용은 심각하다. 폐해는 단발적이지 않다. 두고두고 길게 간다. 예컨대 주식 공매도의 한시 폐지를 놓고 외국투자가의 시선부터 싸늘하다. 표심은 얻을지언정 글로벌 ‘신뢰’는 잃었다. 혹여 외국인이 썰물로 맞설 때, 그때 다시 꼬리를 내릴 것인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