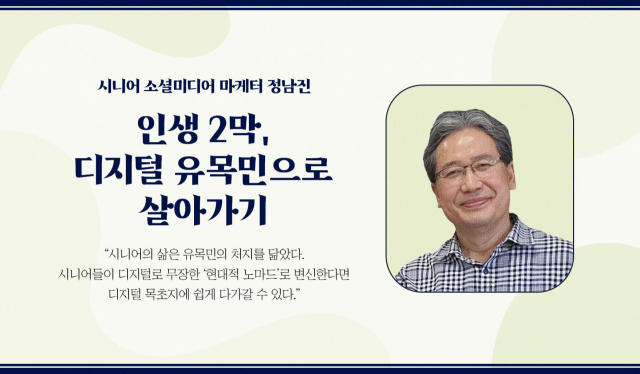얼마 전 시니어 일자리 관련 대화모임에 참석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벌어지는 대화는 언제나 어떤 분야보다 절박하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일자리를 갈망하지만, 시니어에게 제시되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종류의 것들이다. 길면 6개월~1년 정도, 실제로는 2~3개월짜리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시간제 일자리가 많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언저리다. 그런데도 그런 일자리마저 쉽지 않은 요즘이다.
일자리 앞에 서면 시니어는 스스로 작아진다. 연거푸 거절당하다 보면 맥이 풀리는 듯하다. ‘현역 시절엔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삶은 더 고달프게 느껴진다.
인류는 본래 노마드였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실 인류에게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일자리가 생긴 건 고작해야 200년 남짓이다. 그 이전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목민, 즉 노마드로 살아왔다. 일자리란 늘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고달팠을 것이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야생’으로 밀려난 요즘 시니어들의 현실이 어쩌면 인류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일자리는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안정성이나 급여 수준, 복지, 꾸준하게 신장해 온 노동의 권리 등에서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진보해 왔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직장의 안온함에 취해 살다가는 정글 같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코끼리와 벼룩
평생 고용이 사라진 시대에 독립생활자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한 책 ‘코끼리와 벼룩’의 저자 찰스 핸디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역시 다국적 석유기업 쉘(Shell)의 정규직 직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화석이 되어 바깥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하다 결국 독립생활자의 길을 걷기 위해 퇴사를 결행했다. 스스로 회사(코끼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생활자(벼룩)로 살아보기를 자처한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프리랜서나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의 삶이다.
독립생활자로 살아가기
찰스 핸디는 독립생활자로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독립생활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커다란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세계적 경영 사상가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책 ‘코끼리와 벼룩’을 통해 그가 전한 독립생활자 이야기를 몇 개의 문답으로 요약해 봤다.
- 왜 그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왔나.
“대기업의 보금자리를 떠나, 찬 바람부는 들판에서 나 혼자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인생 중간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텐데, 무엇이 그렇게 절박했나.
“자유다. 나는 자유를 얻기위해 안정을 내팽개치고 바로 그 새롭고 무모한 모험의 세계를 선택했다.”
- 그게 ‘벼룩의 삶’인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벼룩의 삶’을 선택하면서 고용의 의심스러운 안전보다는 무소속의 자유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코끼리에서 벼룩으로의 전환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다.”
- ‘벼룩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
“생애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벼룩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충실해져야 한다.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염원하거나 가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 벼룩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뭔가.
“판매다. 자기 자신을 판매하고 자신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벼룩’으로서 당신의 품질은 무엇인가?
“나의 품질을 보장하는 건 나의 최근의 일, 최근의 프로젝트 뿐이다. 과거의 명성이나 경력은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독립생활자로 살아가는 즐거움
요즘 시니어들은 이미 ‘코끼리’에서 ‘벼룩’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노마드적인 삶, 즉 독립생활자의 길로 들어섰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원시시대의 유목민들처럼 고달프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시니어에겐 ‘자유’가 있다. 찰스 핸디가 그렇게 갈구했던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현역 시절엔 갖지 못했던 것, ‘의심스런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자유다.
오렌지 행상에서부터 파트타임 웨이터, 목화밭과 과수원의 인부, 사금 채취공, 부둣가의 짐꾼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갔던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는 그의 책 ‘길 위의 철학자’에서 독립생활자로서의 자유와 일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노천에서 함께 생활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함께 요리하고, 잠을 자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나는 삶을 여행객처럼 살아왔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의 행로에 들어선 여행객인지도 모른다. 시니어의 일자리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고달프더라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가끔은 이렇게 외쳐 보면 어떨까. ‘나는 자유인이다. 독립생활자다. 그리고 당당한 벼룩이다’라고. 찰스 핸디처럼, 에릭 호퍼처럼 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