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과학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의 ‘제2운동법칙’은 ‘F(힘)=m(질량)×a(가속도)’이다. 변화를 꺼리는 관성질량으로 인해 혁신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큰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입해볼 수 있는 곳 중에는 대학을 빼놓을 수 없다. ‘산학협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우승(사진) 한양대 총장은 7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양대 총장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뉴턴의 제2운동법칙을 거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외부의 큰 힘이 역설적으로 대학 혁신에 속도를 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화두에 맞춰 산학협력 교육과 기술산업화를 위해 과감히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산학연계 문제해결중심교육(Industy-Coupled Project·Problem-Based Learning, IC-PBL), 기업과의 R&D·기술사업화·창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대학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미래 교육 측면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학교에만 머무르던 학과와 전공 분야를 산업체를 비롯해 사회와 연계하는 IC-PBL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추진하고 있다. 안산 ERICA캠퍼스 부총장을 지낼 때인 지난 2016년부터 적용했던 것인데 서울캠퍼스에 확대했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이 우선이다. 기업이 문제를 가져오면 교수가 함께 시나리오를 짜고 학생들이 중간·기말 발표를 할 때 기업 관계자도 같이 평가에 참여한다. 교수는 코칭을 하고 학생도 지식의 생산자가 된다. 이를 위해 IC-PBL 수업 공간도 많이 구축했다. 서울대·포스텍 등 130개가 넘는 대학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참고한다. 미국의 구글·애플·넷플릭스·아마존 등이 인력을 채용할 때 직무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구글이 개발해 코세라와 연계·운영하는 6개월짜리 정보기술(IT) 전문 자격증 과정이 있다. 사전 경력이나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IT와 인공지능(AI) 교육을 한다. 매달 49달러만 내고 자격증을 딴 뒤 링크드인(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 채용된다. 등록자는 35만여명이다. 인텔·월마트 등 50여개 글로벌 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런던대나 노스이스턴대는 이 과정을 들으면 12학점까지 인정한다. 대학과 기업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인문학을 포함해 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은 더딘 편인데.
△대학의 속성은 ‘F=m×a’라는 뉴턴의 두 번째 운동법칙과 비슷하다. 가속도의 법칙인데 교수들이 자기 것을 유지하려는 관성질량(m) 값이 커 웬만큼 큰 힘(F)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의 동력(a)을 얻기 힘들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온라인교육 비중도 20%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학부는 99%, 석사과정은 100%까지 확대됐다. 물론 IC-PBL의 경우 경진대회도 하지만 교수들이 문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부담을 느끼는 등 새로운 교육문화 정착이나 교육 내용·방법의 혁신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논문을 위한 논문’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뿌리가 깊다.
△자주 인용되는 논문을 많이 써 영국의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순위가 높으면 외국 유학생을 대거 유치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등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논문·특허·사업화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교수 임용이나 승진 등 업적 평가나 정부 R&D 과제를 받을 때 논문이나 특허 등의 비중이 큰데 연구의 산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물론 기초학문도 튼튼히 해야 한다.
-요즘 대학들이 QS 등에 로비하는 것을 넘어 유명 학회지에 협찬하며 특집논문을 싣는다고 하던데.
△(즉석에서 기획팀장에게 전화해 확인한 뒤) 우리는 유명 학회지에 돈을 내면 논문을 특집으로 묶어 내주겠다는 식의 대행사 요청이 여러 번 왔지만 거절했다. QS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있으면 어떨까 싶다.
-한양대가 상징적으로 과감히 ‘SCI(국제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망국론’을 들며 논문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난다고 선언하면 안 되나.
△일리가 있는 얘기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비슷비슷한 논문을 대량 생산하는 게 문제다. 질 높은 논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전문가에게 피어리뷰(동료평가)를 맡겨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임용·승진 평가에서 논문 비중이 큰 게 기술이전이나 창업에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학과 평가를 교육과 연구 분야로 분리했고, 학과 인센티브는 교육을 잘하는 쪽에 준다.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업·사회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잘할 만한 교수를 뽑는 수밖에 없다. 대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도 잘 구축해 우수 교수도 모시고 소속 교수의 기술이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산학협력이 겉도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정신으로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를 한다. 우수 연구원과 인프라를 갖추면 기업이 찾아온다. 보쉬·아케마·LG화학 등 참여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한다. 지난해 복합재료혁신연구센터·극자외선노광기술센터·차세대송배전전력변환시스템디자인센터·배터리센터·메디슨엔지니어링바이오(MEB)센터를 만들었다. MEB센터는 의대 교수가 센터장인데 의대와 이공대·약대 등이 융합연구를 한다. 한양인문진흥센터도 설립해 다른 학문과 융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 센터당 각각 1억원씩 지원하고 2년마다 평가해 없앨 곳은 없애고 새로 만들 곳은 만드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재료 등 기업들이 회비를 내고 자문이나 공동 R&D를 하는데 이들의 회비도 점차 늘어 배터리센터의 경우 7,000만여원이 쌓였다. 지속 가능한 센터를 위해 각 센터에서 수주하는 정부나 기업 R&D 과제에서 대학이 받는 간접비의 50%를 센터에 환급해준다.
-지난해 말 인공지능센터도 열지 않았나.
△그렇다. 동원산업이 30억원을 기부해 ‘한양AI솔루션센터’를 열어 제조공정 자동화, 스마트 IT, 머신러닝, AI 플랫폼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실적이 많이 나온다. 자연스레 학생들의 AI 능력도 키우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10년간 최대 19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공지능대학원도 개설했다.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하지 않으면 구름 위를 떠다니게 된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우수한 교수와 연구원도 많지만 산학협력 효과가 나도록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다. 대학에 있는 다수의 산학협력 빌딩에는 레드핫·ABB·IBM 등 큰 기업의 브랜치가 많이 들어와 있다. 교육·연구 기능을 산학협력과 연계하면서 창업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대학 체질을 바꿔야 한다. 미국 프린스턴대의 기술이전 수입(2015년 기준)이 바이오·생명과학 등 지식재산권(IP) 4개로 1,600억원가량 됐는데 우리나라 대학 전체 기술이전료의 2배나 될 정도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KAIST의 기술이전료도 지난해에 100억원을 겨우 넘겼다.
-한양대는 ‘실사구시’ 학풍이어서 DNA가 좀 다른 듯하다.
△고창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백관수 선생의 사위로 유명 작곡가이기도 한 김연준 설립자께서 학교를 만들 때부터 그랬다. 그분은 동향 선배인 이용익 선생(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함)의 영향을 받아 부친의 도움을 얻어 기술학교에서 시작해 공대로, 다시 종합대학으로 발돋움시키고 의대까지 키우지 않았나. 한양대 졸업생들은 벤처기업을 비롯해 1만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다른 대학 출신들보다 훨씬 많이 창업했다. 성공한 기업인은 다시 모교 등에 기부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저희도 조만간 100억원의 기부를 한다는 동문이 있다.
-교수와 연구원들이 과학기술 연구를 토대로 창업에 많이 도전해야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 업적 평가에서 창업과 기술이전을 SCI 논문 못지않게 반영해야 한다. 시장과 연계된 연구실을 운영하며 좋은 기술을 개발해 창업보육센터나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사회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 성공률이 높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교수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최고경영자(CEO)는 외부에서 모셔오면 된다. 교수가 특허를 기술이전해 얻은 수입 중 60%(노하우 이전 시 70%)를 갖고 나머지가 대학 몫이므로 많이 도전했으면 한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생명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10~15년씩 기다려주는데 대박을 내려면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수입이 많은 프린스턴대도 1984년에 제약사인 릴리와 협력한 뒤 20년 만에 대박 신약을 내놓을 수 있었다. 스탠퍼드대나 MIT는 정말로 창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창업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기계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한양대ERICA캠퍼스 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산학협력단장·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학연산(學硏産) 클러스터 모범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한양대 총장으로 취임해 교육·연구 측면에서 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특유의 실용 학풍을 진작시키고 있다. 모든 교과목에 산학연계 문제해결중심교육(IC-PBL)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도 겸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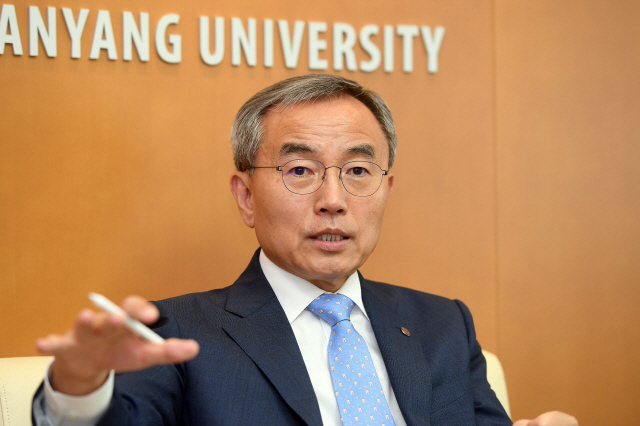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