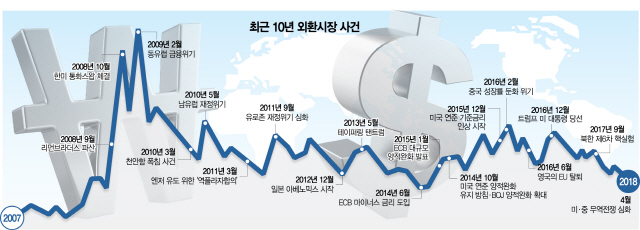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본위제 포기를 통한 달러 절하를 추진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제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환율절상을 요구했다.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높이겠다는 압력을 가한 뒤 상대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해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미국만의 방식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무역장벽을 무기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한 다음 결국 가격변수인 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역역조를 해소해왔다”며 “미국의 오래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전가의 보도’를 꺼낸 것이다. 첫 타깃은 한국이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환율을 연계시켜 원·달러 환율의 절상을 이끌어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이런 전략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환율 문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무역전쟁의 최후 병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향후 수년간 위안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히먼트 바이잘 오펜하이머펀드 연구원은 “2014~2016년 투자자들이 달러 표시 자산 투자를 늘려왔지만 앞으로 이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이 중국에 환율 관련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환율시장 개입 금지 요구에 남북관계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금지에 합의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과거보다 환시장 개입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원화 절상 압박 강화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화가 이미 상당히 절상된 상태라는 점이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화폐가치를 비교하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의 하나인 빅맥지수는 현재 830원대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월(약 900원60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만 보면 이전보다 원화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PPP 환율로는 상당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장 철강 관세 면제가 일부 이뤄졌지만 쿼터가 설정돼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미국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다. 외환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PPP 환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원화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환율이 더 떨어지면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외환당국의 정책수단은 전무하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마당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까지 공개하면 향후 시장 개입은 불가능해진다. 미국과 1차적인 환율 개입 금지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더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정 수준의 환율 개입을 두고 미국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인지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적정 수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나 적정 환율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그 내역이 공개되면서 미국 등의 항의에 직면하게 돼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능현·강광우·김창영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