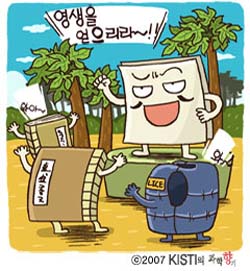|
문자를 사용하려면 그것을 '기록'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중 가장 편리했던 건 역시 종이였다. 그런데 이 같은 종이가 현대에 들어 품질 저하의 수렁에 빠졌다. 만든 지 10년 밖에 안 된 토익책이 수백 년이 지난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빨리 삭게 될까. 우리나라 고문서를 구성하는 한지의 특성을 짚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눈에 띄는 건 한지의 견고한 섬유 구조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껍질의 섬유는 길이가 균등한 데다 서로 간의 폭도 매우 좁다. 게다가 섬유의 방향도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 충격에 강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는 한지를 여러 겹 붙여 화살을 막아내는 방탄복을 만들었을 정도다. 생활용품이던 한지가 방탄복의 재료였다는 점은 놀라운 대목이다. 닥나무의 섬유 길이가 유난히 긴 것도 강점이다. 닥나무의 섬유 길이는 10mm 수준이지만 화학 펄프의 원료인 전나무와 소나무는 3mm, 너도밤나무와 자작나무는 1mm 밖에 안 된다. 닥나무 섬유가 나무젓가락이라면 화학 펄프의 재료가 되는 나무의 섬유는 이쑤시개인 셈이다. 한지가 중성을 띠는 것도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가 산성에 상당히 취약한 반면 중성에서는 별 다른 변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지가 중성을 띠는 이유는 제조공정에서 산성 약품을 전혀 안 쓰기 때문이다. 원료인 닥나무 껍질을 잿물에 넣어 4~5시간 푹 삶고 나면 9.5pH 정도의 알칼리성을 띤다. 이를 고루 펴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아욱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인 '닥풀'을 섞어 7.89pH의 중성으로 정확히 맞춘다는 얘기다. 한지에 식물섬유를 구성하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적당량 섞여 있는 것도 주목된다. 리그닌은 방충효과를 높이지만 섬유를 딱딱하게 만든다. 게다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 수분이나 자외선과 반응, 종이를 누렇게 만들기도 한다. 전통 한지는 11월과 12월에 자른 1년생 닥나무를 쓰는 데 여기엔 리그닌이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함유돼 있다. 때문에 현대 제지공정을 활용하면서도 한지의 명맥을 이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 보존이 필요한 공식 문서나 각종 공예품을 만드는 데 한지를 활용해 '수요'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신발, 그릇, 심지어 휴대용 요강에까지 한지를 광범위하게 썼다. 인사동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 스며 든 한지를 기대해 볼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