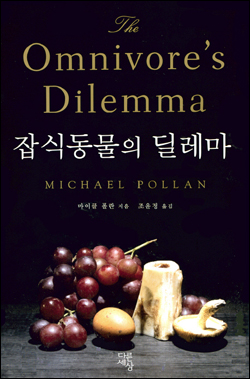■ 잡식동물의 딜레마 / 마이클 폴란 지음, 다른세상 펴냄<br>농장체험등 '음식사슬'추적통해 인간실존 탐구<br>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위한 성찰 계기도 제공
 | | 화가 황순일의 극사실화 '낯선 어둠속' |
|
현대 사회의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코너는 많고 다양한 음식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먹을거리를 고르지 못하고 포장용기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유해 성분을 의심하거나, 매장에 있는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우유, 저온 살균 우유, 유당 분해 우유 중에 무엇이 자기 몸에 좋을지 고민하곤 한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광우병처럼 음식과 관련된 치명적 질병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먹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실상 우리는 원시의 숲 속에서 탐스러운 버섯을 만날 때마다 독버섯의 공포를 떠올리며 그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던 태곳적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다.
저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음식사슬'(먹이사슬)을 추적하여 네 끼 식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네 끼 식사는 각각 맥도널드 햄버거, 산업 유기농 음식, 산업화된 유기농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초유기농 음식, 자신이 직접 사냥·채집한 음식이다.
저자는 서적과 통계자료에 파묻혀 책상머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나서 식탁에 이를 때까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실제로 쫓아다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옥수수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옥수수 제분 공장과 식품 회사와 도살장을 찾아다니고, 캘리포니아의 숲 속에서 자기 몸무게만한 야생돼지를 사냥하기도 한다.
특히 조엘 샐러틴의 농장에서 체험했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는 그 자신이나 독자 모두에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 유기농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거대 식품회사들의 특화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농업이 실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책은 재미있고 생생한 음식 탐험기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이며,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철학자로서 저자는 사실 대단히 집요하고 까다롭다. 전작 '육식의 윤리학'에서 그는 동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육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와 다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동물을 차별하는 종차별주의자임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에 흑인을 차별했던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라는 주장이다.
책에서는 간혹 이런 곤혹스런 질문을 만나게 될 테지만, 독자들은 매일 먹는 식사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