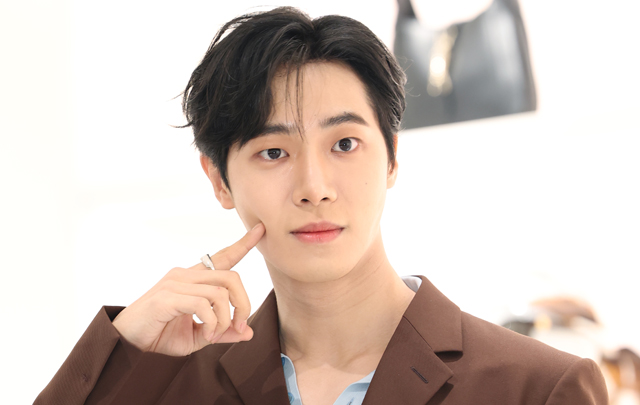‘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받을 금액이 100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70~80에 동의하면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해보겠다’는 제안일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낸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지적이다.
이 지적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고용부에서 체불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가정이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와 피해금을 깎는 방식으로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보고서는 실제 피해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금이 깎이고 있다는 추론의 근거는 합의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가 되레 ‘주도권’을 쥐는 일종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임금체불 신고건수 중 45%는 반의사불벌로 종결된다.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임금체불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사용자가 우선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해야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체불 사건 당사자가 대부분 퇴직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굳이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피해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받는 게 고용노동행정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임금체불이 2조448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금체불 대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경기 악화와 대유위니아, 큐텐 등 특정 기업의 대규모 체불이 체불금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청산율은 81.7%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보고서처럼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반의사불벌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을 받고 근로자가 떼인 임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액과 위로금까지 지급한다”며 “하지만 임금체불 합의는 형사합의임에도 피해액을 감면하는 기형적인 형태다, 높은 체불임금 청산율은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종용을 통한 빠른 임금체불 수습의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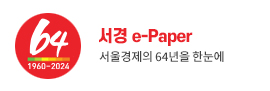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