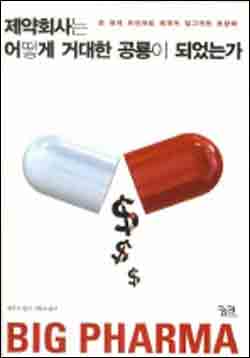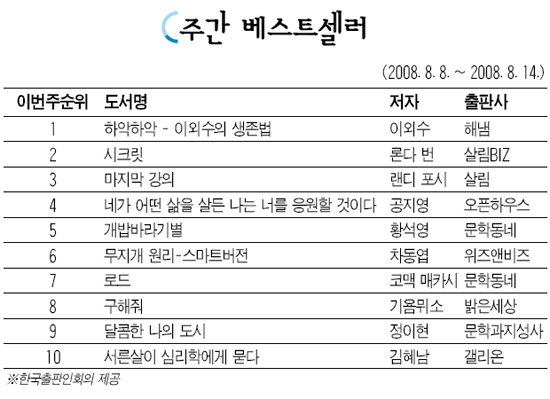■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 ■ 재키 로 지음, 궁리 펴냄<br>英저널리스트가 제약사 이윤 적정성등 통계 바탕 분석<br>리베이트등 마케팅비용 과다·불필요한 소비 유도 비판
비빔밥 한 그릇에 10,000원을 받는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소비자라면 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통상 4,000~5,000원 정도인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기 때문. 하지만 감기와 알레르기 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라리틴 1정에 300원을 받는다면 어떨까?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책의 서문에 담긴 추천사에서 김홍표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너희다.’
책은 거대기업이 된 제약회사들의 성장 과정과 약값의 적정화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다. 영국의 약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만큼 신문, 잡지 등에 실린 통계와 관련 기사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미국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지’의 전 편집자 마르시아 엔젤은 “2002년 미국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제약회사 10개의 이윤을 모두 합친 액수(359억 달러)가 나머지 490개 기업의 이윤 총액(337억 달러)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일반기업의 평균 순수익률은 매출 대비 3.3% 정도인데 반해 미국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경우 무려 1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990년대 글락소에서 개발한 위장약 ‘잔탁’은 연간 24억 달러를 벌어다 줬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으로 책정한 약품 가격이 사회에서 용인할 만큼 합리적인 수준이냐는 점이다. 저자는 이 점을 지적한다. 한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제약사의 연구비는 약품 하나당 무려 8억200만 달러에 달한다.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이다. 저자는 연구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 만은 아니라고 한다. 만약 그 돈이 연구에 쓰이지 않고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됐더라면 얻게 될 수익까지 포함한 액수라고 주장한다.
제약회사들은 마케팅 비용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쓴다. 마케팅 비용이 총매출의 36%에 달할 정도이다. 일반 기업들이 매출의 약 10%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중 적잖은 금액이 의사, 정치권에 리베이트와 로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 전세계 의약품 소비액이 1972년 200억 달러에서 2004년 5,000억 달러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저자는 “약품 소비의 폭증이 시민 건강이나 복지 향상을 불러오기보다는 오히려 대중들을 약품 남용과 같은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경고한다.
화이자, 노바티스 등 거대 제약업체는 이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소비자들이 약품에 대해서도 똑똑해져야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