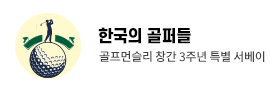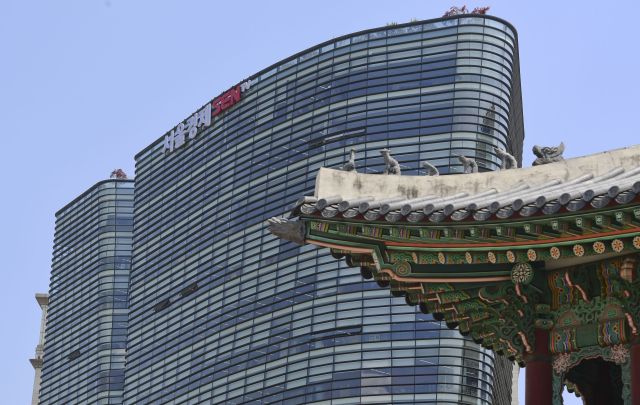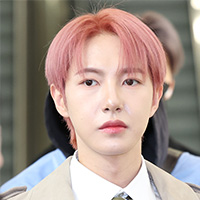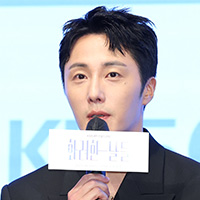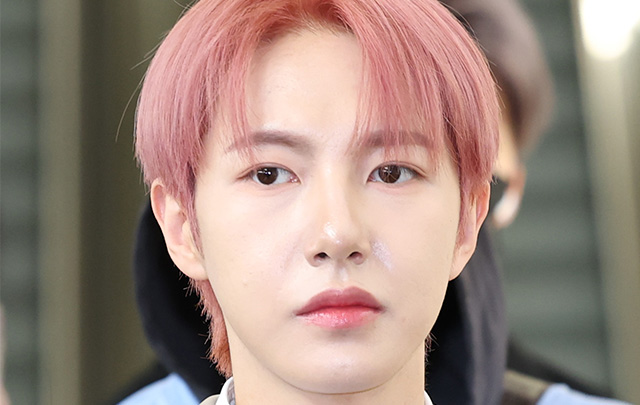최근 한달 새 잇따라 터져나온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ㆍ아귀다툼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여실히 일깨워주고 있다. 스폰서 검사와 벤처 여검사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초임검사, 개혁은 시늉만 내면 된다고 한 중견검사에 이어 수뇌부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이전투구를 벌였다. 검찰 간부들이 총장실에 떼로 몰려가 물러나라고 압박한 것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감찰과 중수부 해체 카드를 꺼낸 총장의 행태는 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 수뇌부 내분은 그런 연속 시리즈의 클라이맥스다.
이제 더 이상 검사의 손에 개혁과제를 맡길 단계는 지났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명분을 잃었고 타이밍도 놓쳤다. 청와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수습하라고 하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더더욱 아니다. 채동욱 총장대행체제로는 그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은 조직과 기능 재편은 물론 특권적 처우와 관행을 망라한 전면적 외과수술이 불가피하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막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중수부 폐지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설특검제 도입 같은 다양한 개혁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지만 결실을 거두려면 검찰의 수용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그 어떤 개혁과제가 주어지든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검찰 길들이기니, 수사무력화니 이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