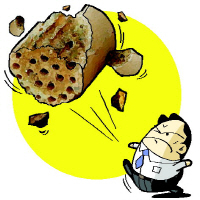|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중략)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중략)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안도현의 시 '연탄 한장'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연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이기적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굳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터. 새벽녘 연탄을 갈아 넣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달라붙은 연탄 두 장을 떼어내는 데 부엌칼의 요긴함은 또 어떻고. 제 몸 태우고 남은 연탄재는 눈길 미끄럼 방지에 특효였다. 지금은 취약계층과 화훼농가가 사용하지만 1970년대까지 연탄은 사실상 모든 가정에서 사용했다. 1960~1970년대 황금기는 '연탄파동' 후 에너지정책이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전환하면서 막을 내렸다.
△구공탄(九空炭)은 연탄의 다른 이름. 19개의 구멍 개수에서 딴 것인데 십자를 빼고 편의상 그렇게 불렀다. 현재 3.6㎏짜리 가정용 연탄의 구멍 수는 22개다. 연탄은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생산원가는 한 장당 647원이지만 공장도 가격은 373원.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지만 생산할수록 손해본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한때 347개에 이르던 탄광은 태백과 삼척, 화순 3곳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국내 무연탄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석탄공사의 운명이 간당간당하다.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내몰렸는데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폐광 가능성에 광부들은 좌불안석이다. 빚만 1조원이 넘고 팔 자산도 별로 없다. 가격 현실화는 더더욱 어렵다. 분명한 건 지금도 연탄 한 장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 계층들이 적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그런 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른 수건도 짜야겠지만 석탄공사를 이른바 '신의 직장'과 동류 취급해선 곤란하다. 석탄정책, 연탄재 걷어차듯 함부로 다루지 마라./권구찬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