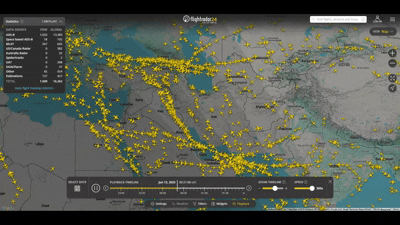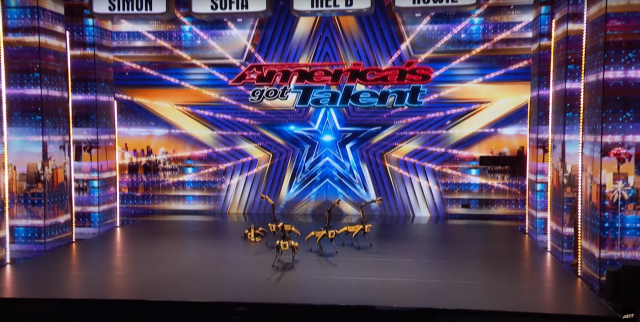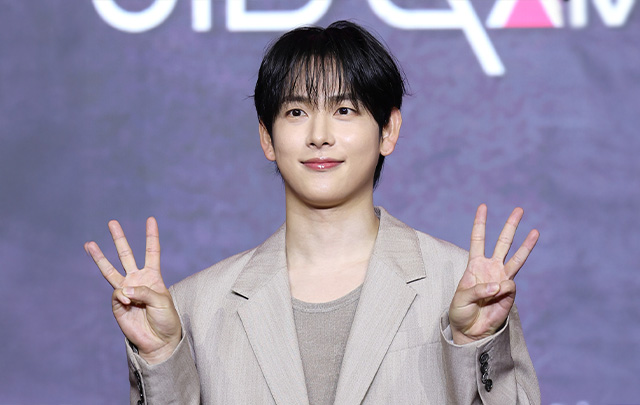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삼성전자 스마트카드사업부 등 4개 시스템통합(SI) 사업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한 삼성SDS. 생존 위기에 몰려 있던 삼성SDS는 출범 석 달 뒤인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SDS는 최저가인 17억 4000만 원을 써내며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다. 행자부가 그룹웨어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으니 이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를 필두로 삼성SDS는 컨소시엄 혹은 독자 사업팀을 꾸려 김대중 정부가 선정한 전자정부 11개 중점 사업 중 7개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부 예산이 신수종 기업을 살린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삼성SDS는 공공 부문에서 실력을 키워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지난해 매출 1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9111억 원을 실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제2·제3의 삼성SDS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20여 년 전처럼 정부가 앞장서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AI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로서 기업들의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SI 업체들의 나눠 먹기를 조장하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 2013년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진출을 막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생겨난 뒤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정부 부처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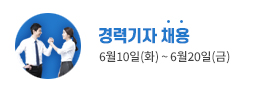







 abc@sedaily.com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