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 교육, 환경, 육아, 노동 등 삶 곳곳에 밀접하게 녹아든다. 정책이 정당적, 이념적, 윤리적 가치만 고려돼 추진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놓쳐버린 기회비용 등을 낳는다. 신간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책의 저자는 정치학자인 스티븐 로즈다. 그는 경제학으로 생각하는 정치학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그가 미래 행정가, 정치인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위해 집필한 것으로 경제학적 사고방식, 적용법을 잘 설명한 책으로 인기가 높다. 최신판 출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저자에게 직접 감사의 이메일을 보낼 정도다.
저자는 사소해 보이는 이슈들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서문에서 ‘톱밥’을 누가 가져가야 할지 질문을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우유 가격이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당시 낙농업자들은 소들이 우유를 더 잘 생산해내려면 편하게 누워 잘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바닥에 톱밥을 깔아줬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들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톱밥을 더 많이 까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톱밥은 건설업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파티클 보드의 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높아진 우유 가격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려다가 집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겪는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 모두의 불만을 적정선에서 조절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는 톱밥을 어디에, 얼마만큼 분배해야 할지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들도 신랄하게 꼬집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뉴욕시의 규제다. 뉴욕시는 2012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열량이 높은 탄산음료를 16온스(473cc)를 초과하는 컵에 담아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 정책은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16온스 컵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비효율적이었다. 비만율을 낮추려면 규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자는 “1985년 경제학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 기회비용을 고려했고 정부의 의제에 관해 생각할 때 외부효과 개념을 활용했다”며 “이런 개념들은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경제학자들의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2만85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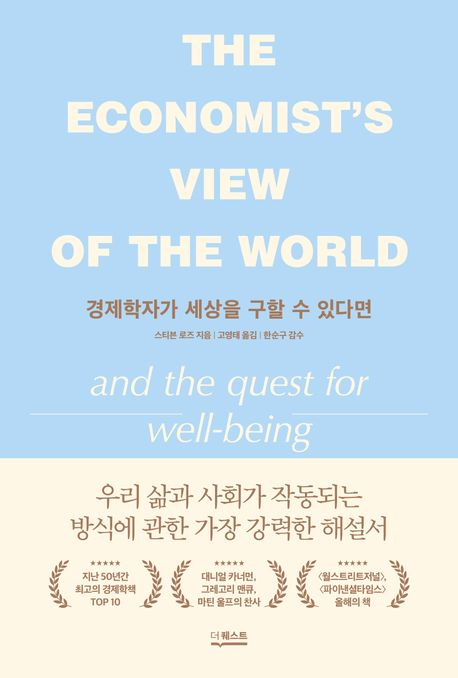
 jikim@sedaily.com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