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여.) 기득권자들이 베푸는 선의에 기대서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희망을 버려라. 들이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소설가 김훈(74)은 최근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문학동네) 출간을 기념해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세계의 악(惡)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더 완강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출구 없는 청춘들의 고통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담아왔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산 한 월남 어부, 가정이 해체되고 일터에서 밀려나는 노인 등을 비롯해 방값을 아끼려고 동거하는 9급 공무원 준비생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특유의 건조한 문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는 작가의 말대로 밑바탕을 관통하는 시선은 응원과 애틋함이다. 김 작가는 “무슨 철학이나 메시지나 교훈을 말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 자신과 인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글을 쓴다”며 “그것이 구태여 철학이나 메시지가 아니라도 괜찮다. 오히려 아닌 쪽이 더 좋다. 다만 드러내 보이기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비정규직이나 취준생와 같은 소외된 자들의 절망이나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작가로서는 이례적인 작품 세계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김 작가는 “보수를 자처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회의 ‘종자분류법’에 따라 ‘보수’로 분류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른바 ‘진보적’으로 보일 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보수’라는 분류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아무 주의자도 아니다”며 일갈했다. “나는 이 세상의 온갖 주의자들을 혐오한다. 나는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사유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이번 작품은 2006년 ‘강산무진’에 이어 16년만에 내놓은 단편 소설집이다. 그는 이처럼 장편에 이어 단편이 드문 이유에 대해 “단편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것을 붙잡아서 이야기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며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밖에 없다. 쓸 수 있는 것들을 겨우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소설은 인간의 내면이나 사물의 안쪽으로 더 깊게 접근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단편과 장편이 주제 면에서 다르지 않다. 단편이라고 해서 더 가볍지 않고 더 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즐겁고 설레기도 한다. 그러나 연필을 쥐고 쓰기 시작하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가혹한 노동의 나날들이 계속된다”며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쪽을 향해서 언어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을 때 글쓰기는 지옥과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원고지와 연필을 고집하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원고지와 연필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삶의 스타일”이라며 “연필은 나에게 글쓰기의 육체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 육체성이 없으면 쓰지 못한다. 나의 낙후된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작가는 구상 중인 차기작은 “아직 없다”며 다만 “당대의 약육강식과 아비규환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문학의 대가’로 평가받는데 대해 ‘대가’라는 말 자체가 역겹다고도 했다. “글을 쓰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절벽과 마주 대하고 있으므로 누구도 ‘대가’가 아니다. 소설가가 아니라 한 늙은이로서, 여생을 경건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무 책, 책 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고 정직하게 조직하는 일에서 길을 찾기를 바란다”며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관계들 사이로 뻗어 있다”는 말을 남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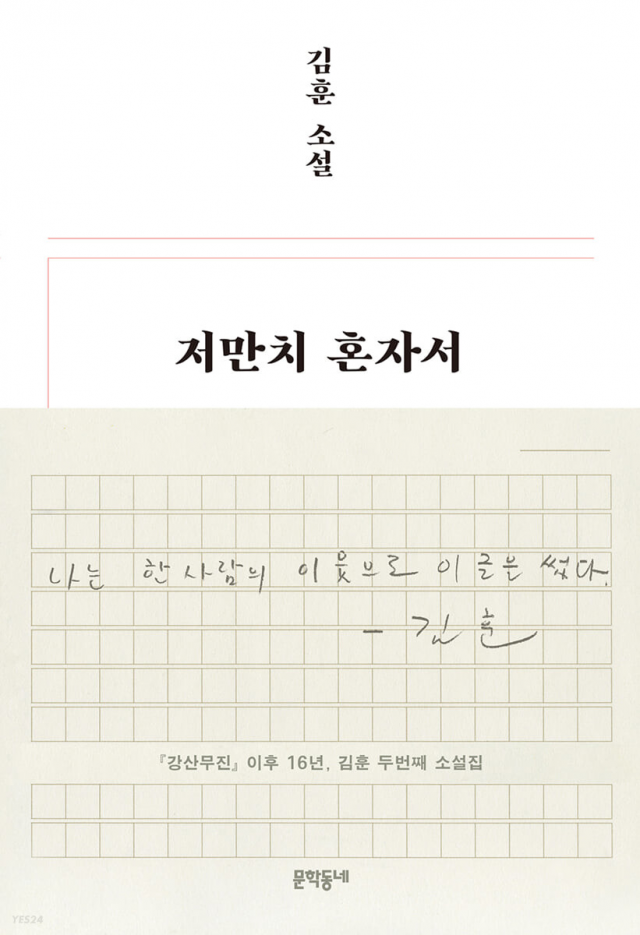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