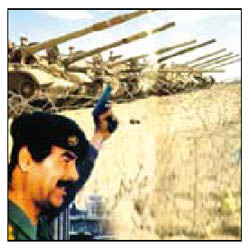|
1990년 8월2일 새벽 2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었다. 세계는 이를 반신반의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양국간 영토분쟁과 보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왜 ‘갑작스레’ 쿠웨이트를 쳤을까. 중동지역의 패권을 향한 후세인의 야심과 재정난 때문이다. 무엇보다 돈이 궁했다. 이란과 8년 전쟁으로 인력과 재산을 손실한 마당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대에 형성돼 재정이 고갈 직전이었다. 쿠웨이트 역시 빌미를 제공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국제적 불문율을 깨고 국경지대에 유전을 건설한 탓이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자국의 지하자원을 도둑질했다며 24억 달러의 보상금과 채무 100억 달러 탕감, 일부 영토 할양 등을 요구하다 끝내 전쟁을 일으켰다. 전투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불과 6시간 만에 수도인 쿠웨이트 시티까지 이라크군의 손에 넘어갔다. 침공 일주일 만에 소규모 저항까지 진압한 이라크는 양국의 합병을 선언, 서방은 물론 무슬림 형제국가들의 반발까지 샀다. 후세인의 도박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이듬해 1월 17일 시작된 반격에 이라크군이 사실상 괴멸되고 후세인도 국제적 영도력을 잃었다. 이라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떨어졌다. 문제는 미국의 처지 역시 어려워지고 세계경제도 홍역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두차례 걸프전과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ㆍ사형으로 이라크 저항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정반대. ‘제2의 베트남’으로 변한지 오래다. 무한정 들어가는 전비 탓에 달러화도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철군 없이 달러화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입장은 진퇴양난이다. 28년 전 시작된 총성은 언제나 그칠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