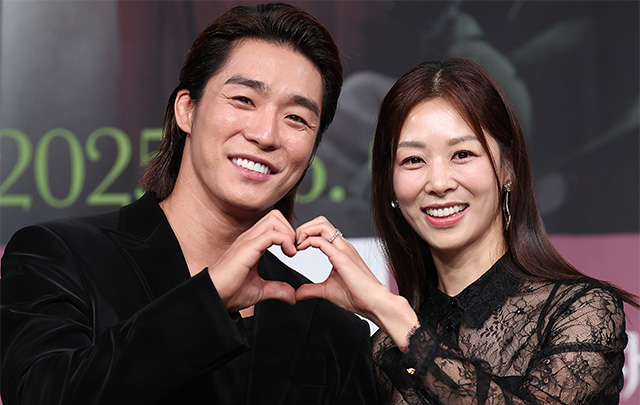“국가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일인데 도와주시니 감사할 일이죠.”
이달 17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하나로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용 혈액·소변 채취에 앞서 문진을 맡은 의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국민 77만8000명, 2032년까지 10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올 초부터 하나로의료재단,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48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행 중이다. 한국인의 ‘유전체 지도’를 만들어 신약,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인과 중증·희귀질환자로 구분해 건강검진과 함께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48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되고, 중증·희귀질환자는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3곳 중 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연평균 17만 명이 참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체혈에 앞서 약 20분간 사업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절차와 목적, 생활습관 관련 설문조사도 했다. “국가사업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인만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참여 후에도 연구에 쓰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검체는 혈액 22.5㎖, 소변 10㎖면 충분했다. 혈액과 소변은 DNA, 연막·혈장, 혈청 분석에 쓰이고,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청의 바이오뱅크에 저장된다. 특히 혈액은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시퀀싱 작업을 거쳐 개인별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데 쓰인다.
백롱민 사업단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은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를 “일종의 ‘몸의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각자 앓고 있는 질환의 원인, 기전 등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100만명 중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수천~수만 명은 있을테니 훗날에는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빈혈과 담석증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특정한 소화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논문도 최근 나왔다”고 소개했다.
20년간 50만 명의 바이오데이터를 수집해 이 분야 세계 선두 국가인 영국은 벌써 후속 연구에 돌입했다. 참여자들을 추적관찰한 결과 1400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 유전체와 임상데이터를 역추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참여자 중 10만 명을 뽑아 전신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 영상데이터까지 확보하는 중이다. 백 단장은 “앞으로 의료·건강·바이오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음 세대, 미래 의료를 위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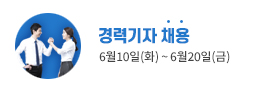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