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일러야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해외 기업이 개발한 약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서대원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패싱'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 중국처럼 시장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보건당국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약값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신약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SK바이오팜(326030)이 개발한 3세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이런 현상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에서 2019년 11월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이듬해 5월부터 활발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합작사와 함께 아시아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연되면서 미국, 유럽 시장과 간극이 벌어졌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독 한국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해외 신약들과 사정이 비슷하다. 벨기에 제약사 유씨비파마(UCB)가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빔팻(성분명 라코사미드)'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해 비급여 상태로만 처방되다 2018년 철수했다. 보험당국과 약가 협상이 늦어지는 사이 빔팻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출시한 제네릭(복제약) 제품들이 먼저 급여 처방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뇌전증 환자의 30%가량은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충분한 기간 복용해도 발작이 잡히질 않는다. 이른바 난치성 뇌전증이다. 5가지가 넘는 약을 동시에 처방받는 환자도 제법 된다.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한 나머지 국산 신약을 구하러 미국 병원에 문의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서 이사장은 "뇌전증 발작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부정맥을 일으켜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질식, 익사 등 사고 위험이 높다. 드물지만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물로 발작을 충분히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환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약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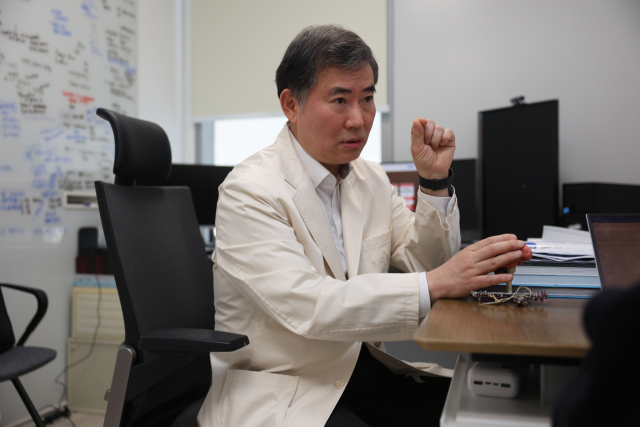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