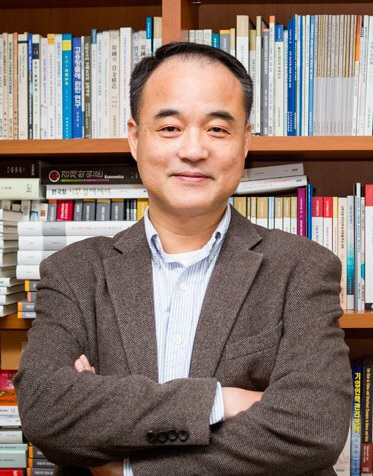18~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를 토대로 상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했다. 군주제와 같은 경직적 위계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모색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경제적 성취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커져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식인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도 여기에 편승해 당시 경제력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풍요보다 공동체에 봉사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더 치켜세우며 정부 주도의 강한 독일의 재건을 주창했다. 중산층은 이를 지지했고, 히틀러에게 독재의 길을 깔아줬다.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는 1944년 초판된 ‘노예사회로 가는 길’에서 히틀러의 나치즘을 사례로 들어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당시 유행처럼 사회주의에 동조하던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새마을운동이나 어려운 회사를 살리려는 노사협력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사고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공동체 이익인지조차도 민주적 합의가 어려울 때가 많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을 선택할 ‘결정권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역설한다. 결국 사회주의는 생각이 다른 구성원에게 비자발적 협력을 강요하고 이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를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것이 독재로의 길을 열게 되는 이유라고 했다.
20세기를 통해 세계는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이 공산주의 독재 권력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았다. 불평등 해소는 모든 이의 염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에서 독재 권력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평등이라는 이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단을 형성하고, 거기 속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자유를 구속하고 인권을 침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동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국가에서만 독재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정권을 거머쥔 지배 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아리안 국가 건설을 위해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유대인의 인권을 외면했던 독일 국민이 나치 하에서 살았던 삶도 다르지 않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사악한 ‘기형적 평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이었기에 하이에크는 이를 노예사회라 불렀다.
2020년 팬데믹 초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우리 국민은 이 지침을 매우 잘 따랐고 지하철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본인 보호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마스크 끈이 끊어져서 부득이 맨 얼굴로 지하철에 탔다고 상상해 보라. 다른 승객들이 힐끗 보고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며 이내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심히 열중할 수도 있고, 경멸하는 시선으로 계속 흘겨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상황은 어떠했겠냐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은 씁쓸하게 후자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것은 높이 살만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반감은 사회주의적 사고의 한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축적되면 위험한 집단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들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포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반사회적 일탈로 매도하는 집단주의다. 소위 팬덤이라 불리우는 이런 집단주의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을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도배하며 망국적인 팬덤 정치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상화되면 80년 전 하이에크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