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분만실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의사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아닌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이렇게 배상금 규모가 큰 직군을 본 적이 없대요.”
오상윤 예진산부인과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모두가 거기 있는 네 잘못이다, 억울하면 그만두라고 말하는 기분이다. 매일 아침 병원에서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26년 차 분만의인 오 원장은 경기도 시흥시에 단 한 곳 남은 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유독 ‘아이들이 예뻐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의 경이로움에 매료돼서’같이 거창한 이유로 분만 전문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 도합 7년간 트레이닝을 거쳐 개원을 준비할 당시에는 비만·미용시술이나 난임클리닉을 운영해볼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수련 병원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고 제일 잘하는 것을 해보자’며 오래 고민한 끝에 분만 병원을 시작했다.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임산부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을 지켰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장이 날아왔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지 닷 새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산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었다.
그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1심에서 기각되기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고 회고했다. 원고 측에 브로커가 붙었는지 3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한 배상금은 1년 뒤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18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의료 현장의 상황을 이해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하면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만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허탈함이 몰려왔다고 했다.
지난한 싸움은 끝났지만 분만 환자는 30% 가까이 줄었고 언제 또 소송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았다. 그가 몇 안 되는 ‘동지’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도 언제까지 (분만실 운영을) 할지 모른다”며 머쓱해하는 이유다.
2006년 개원 당시만 해도 시흥시에는 분만 병원이 7곳이었다. 17년 새 시흥시 인구는 20만 명 늘었는데 다른 병원들은 하나둘 분만실 운영을 중단했다. 평소 먼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산전 진찰을 다니는 산모들은 당직 의사만 있는 늦은 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만 지역 병원을 찾는다. 소위 경쟁 업체가 줄었는데도 수익이 늘기는커녕 위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올해 5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분만의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분만병의원협회에 소속된 기관은 120곳 남짓이다. 협회 소속이 아닌 분만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면 400여 곳으로 늘어나지만, 매년 관련 병의원 수가 급감하면서 분만취약지가 늘고 있다. 특히 분만 관련 의료 소송의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뛰면서 분만 병의원들의 이탈 현상은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자고 일어나면 분만실을 접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는 “산부인과 의료 소송은 이미 의사나 단일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기피과·낙수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과실 분만 사고가 국가 전액 보상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 사고’라도 형사나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산모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분만 의사들을 폐업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그는 분만 인프라를 소방 인프라에 비유한다. 지역 내에 분만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갑작스러운 화재가 생겼을 때 5분 내에 도착할 소방차가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는 “분만 인프라를 둘러싼 환경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지금 속도로 붕괴가 일어나면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사법부의 왜곡된 의료 지식에 따른 무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부디 더 늦기 전에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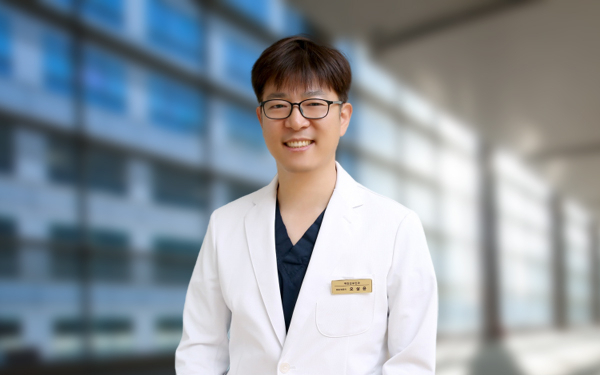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