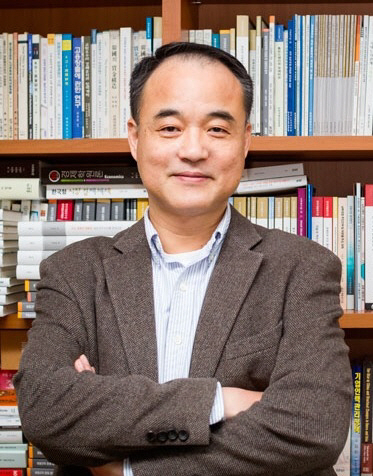내년에는 대학교·초등학교·유치원 입학생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트리플 절벽이 온다고 한다. 저출산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자 비중도 급격히 늘어 부양 비율은 높아가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60세 정년이 도입됐고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저출산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금 개혁도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하니 급한 대로 고연령층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실 50대 중반 정년퇴직은 한창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도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60세 정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반드시 동반됐어야 할 임금 조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당시 학계와 정부 모두 임금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년 연장에 연계할 방안 마련에 몰두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사가 이를 외면하고 임금 조정이 누락된 60세 정년 도입을 합의 처리해버렸다.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으며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사업체가 65.1%에 이르고 신입 사원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사업체도 25.2%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56~60세 고용 규모가 4명 증가할 때 15~29세 청년층의 일자리가 1개씩 사라졌다고 한다.
부양 비율을 낮추겠다고 시작한 정년 연장이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한다니 정년 연장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은 임금 조정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현재 임금에서 적정 고용 규모는 300명이고 매년 10명씩 신규 채용한 뒤 30년간 재직시켜 300명 규모를 유지해왔다고 하자. 그런데 정년이 5년 연장되면 재직 기간이 35년으로 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10명으로 유지할 경우 근로자 수는 350명으로 적정선인 3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때 임금이 낮아지면 350명이 모두 고용될 수 있지만 임금이 경직적이면 기업은 300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모 대기업에서는 노조의 요구로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 1800여 명을 재고용했는데 10년 만에 이뤄진 기술직 신규 채용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0명이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 연장이 오히려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에 연동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피크제처럼 정년에 가까운 일부 고연령층의 임금만 깎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어야 한다. 임금을 낮춘다고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재직 기간이 30년에서 35년으로 연장되면 연봉이 14% 하락한다고 해도 생애소득은 동일하다. 즉 정년 연장으로 늘어난 고용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하락 폭이 14% 미만이면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근로자의 생애소득이 늘어나는 윈윈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필요한 임금 하락 폭이 14%를 넘는 다면 그런 정년 연장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므로 굳이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한편 정년 연장에 연동해 임금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기존 정년을 적용하는 투트랙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이런 임금 조정을 전제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생애소득도 늘릴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노조가 청년층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고 임금 조정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