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 사례보다는 노사대립에 따른 생산성 저하 케이스가 더 많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3조원가량의 적자를 낸 한국GM의 실적 부진의 이유를 두고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때문”이라거나 “과도한 부품비 수수가 문제” “강성노조의 이기주의 탓”이라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간당 20여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생산량에는 노조의 책임도 있다.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에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생산성 제고에는 힘을 쏟지 않은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대자동차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의 자동차 1대 생산시간(HPV)은 26.8시간으로 경쟁사인 도요타(24.1시간), 폭스바겐(23.4시간)보다 길다. 현대차 해외공장의 자동차 1대 생산시간은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비해 오히려 짧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 17.8시간, 인도 16.9시간, 미국 14.4시간인 반면 국내 공장은 28.4시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생산성의 이유로 노사대립을 꼽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회사가 시간당 생산량을 몇 대로 가져갈지, 작업방식과 라인별 인원배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하나하나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임금 협상 등에서 얼굴을 붉힌 노조가 ‘노(no)’하게 되면 생산성 제고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산성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비단 대기업 강성노조만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도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 ‘성과연봉제 및 고용유연화에 반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조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계는 이들 노동정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되레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막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며 “결국 이 같은 경직화를 주도한 노동계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노동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변화의 바람도 감지된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근무형태 변경 및 작업시간 단축 등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합리적인 생산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는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판매물량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의 한 직원은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이 높아져야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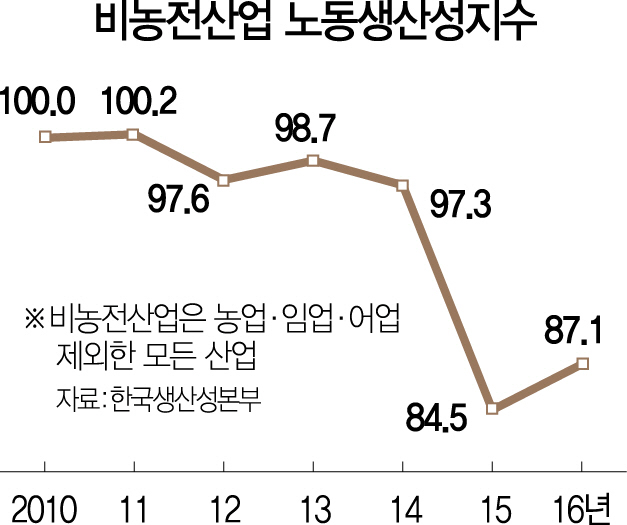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