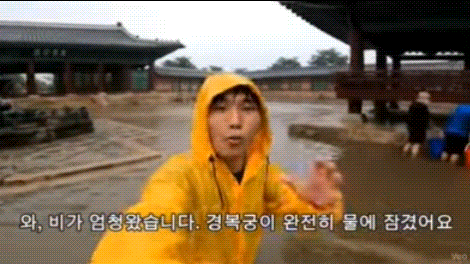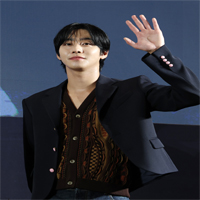지진 파형은 크게 P파와 S파로 구분되는 데 어떤 파형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인공지진과 자연지진 여부를 파악한다. 자연지진은 대부분 S파 진폭이 P파 진폭보다 더 크거나 같다. 지진으로 인한 음파는 발생하지 않는다. 축적된 에너지가 단층운동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큰 진폭의 S파가 관측된다.
반면 인공지진은 P파의 진폭이 S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 폭발로 인한 음파가 발생한다. 지진파의 초동을 보면 대부분 압축으로 나타나고 에너지 방출시간이 짧다. 인공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수십~수백m로 깊이가 얕은 것도 특징이다.
소리를 통해서도 인공지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북한의 2·3차 핵실험 후, 강원도 간성 등에 위치한 국내 공중음파 관측소에서 핵실험에 의한 공중음파 신호가 탐지됐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핵폭발로 발생한 강력한 충격파가 지표에 도달해 대기압을 변동시키고, 이 압력변화가 대기를 따라 전파해 국내 관측소에 기록된다. 지난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을 보면 발생한 지진파 초동은 핵실험 발생순간으로부터 약 44초 후에 전방지역 지진관측소에 도달했다. 순차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관측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따라 전국 134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이용해 핵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일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방사선 분석방법으로는 원자폭탄 실험인지 수소폭탄 실험인지 여부는 한계가 있어 북한 4차 핵실험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권홍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