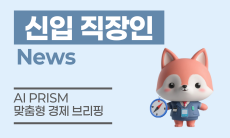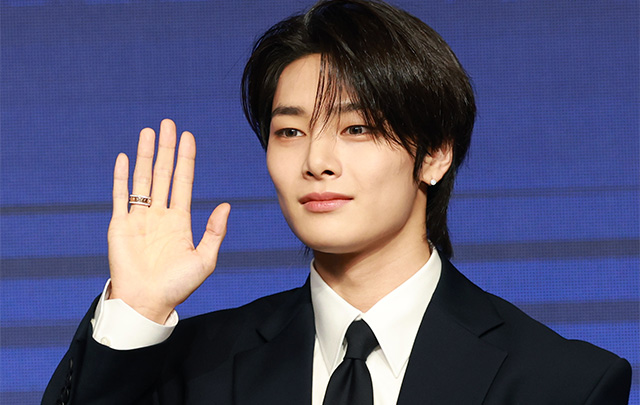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은 험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로운 제안이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 합의문 발표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 약속도 맺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며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 관계의 진전도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 사겠다”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호응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첩첩산중의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속 실무 협상에서 ‘디테일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날 회담 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재차 압박하며 한미 간의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무장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선의를 짓밟았다. 2018년 미국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미국이 5개 핵 시설 해체를 요구하자 이를 뒤집었다. 북한과의 ‘대화 조급증’에 걸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더 멀어지게 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