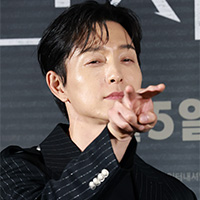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각국은 끝나지 않은 무역전쟁에 혼이 빠져 있는 모양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기업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숫자로 표현된 관세율 그 이상이다. 최근 뉴욕에서 만난 금융기관 현지법인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디테일(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대부분이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25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숨에 끊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시스템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쇼맨십에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느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처럼 경제정책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거래’라는 사업가적 접근법을 따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로 표현되는 투자금 액수와 ‘쇼 비즈니스’ 같은 이벤트 연출에 다른 정치인보다 유달리 집착하고 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할 때도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3500억 달러 같은 상징적인 숫자에 방점을 찍었다. 반도체 품목 관세 100%,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대미 투자 등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쇼 비즈니스’ 성향도 강하다. 단적인 예로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망신을 준 장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미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고도의 연출 전략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적극 활용해 과감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맺은 무역 합의의 구체적 사안을 넉넉한 액수로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나란히 세우는 장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민 대부분이 한국 대통령은 모르지만 삼성과 현대차 등은 아주 잘 알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년 5개월 정도 남았다. 레임덕 기간을 빼면 아무리 길어도 3년 남짓이다. 지금 어떤 금액을 제시한다 해도 그 투자가 모두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언젠가 복원해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이어받으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도 ‘미국이 돌아왔다’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력화시켰던 방위비 분담과 한미 동맹, 공급망은 즉시 원상 복구됐다. 공화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현 정부와는 다른 성향을 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패권 국가가 정치적인 장삿속으로 부추기는 거래에는 장사꾼 기질로 대응하는 게 상책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찌 됐는지, 윤석열 정부 초반 대기업들이 약속했던 1000조 원 투자는 어디로 갔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정치적 목적의 거래를 두고 고지식하게 계산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는 흔들리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을 수주하려고 유사시 현지에 한국군을 파견한다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비공개 조건으로 걸었다.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안전한 전략은 패권 국가 지도자의 심기를 맞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언급한 숫자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