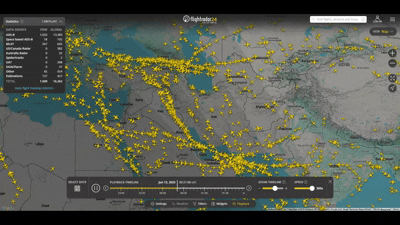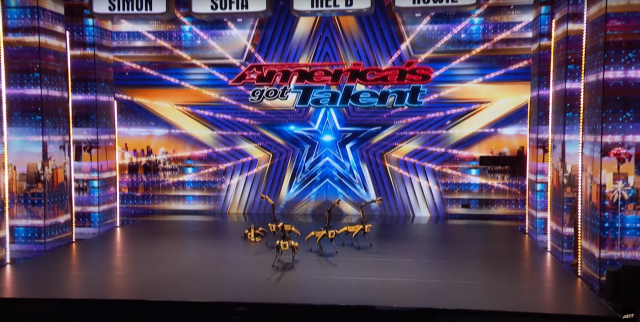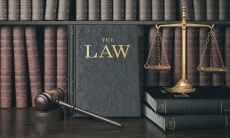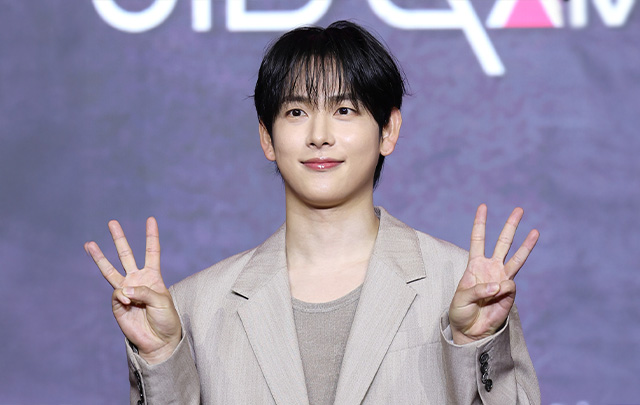불확실한 경제와 위기 상황에서 미 국채와 달러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선호됐다. 경제 충격이 우려될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 확보에 나서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달러 스와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무역 전쟁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계 무역 질서의 붕괴나 글로벌 침체에 대비해 달러를 확보하는 대신 달러 표시 자산을 팔아 치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10일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7.10% 하락했으며 30년물 국채는 지난 4거래일 동안 40bp(1bp=0.01%포인트)가량 떨어지며 가격이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 가치는 7% 이상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팔고 또 다른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인 스위스프랑으로 옮겨 타면서 프랑 가치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달러당 160엔대를 바라보던 엔화도 현재 143엔대까지 가치가 치솟았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스케 수석 외환 전략가는 “앞으로 미중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140엔대 아래로 진입을 시도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외환 리서치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우리는 주식과 달러·채권을 비롯한 모든 미국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붕괴하는 생소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주먹구구 식 관세율 산정이나 대통령 발표 자료와 실무 지침 사이 수치 불일치, 발효 이후 하루도 안 돼 뒤집히는 관세율 등 정책 추진 전반에서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보케캐피털의 창립자인 킴 포레스트는 “심지어 신흥국 시장에서도 정책이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은 증폭됐다. 증시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이틀 전 장중 60을 넘기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VIX지수가 이 수준을 넘은 것은 1990년 이후 단 3차례에 그친다. VIX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상호관세를 한시적으로 10%로 낮춰 적용하면서 30대로 떨어졌지만 이날도 50을 넘기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단기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VIX지수로 불리는 채권변동성지수(MOVE) 역시 전날 172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급으로 치솟았다. 코로나 19 팬데믹 발발 당시 16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이 격화할수록 투자자들이 달러와 국채를 매도하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크로스트래티지스트의 전략가인 사이먼 화이트는 “관세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이상 세계는 성장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며 “통상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만 (최근 상황에서 보듯) 미국 국채와 달러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무위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벤 윌트셔 씨티은행 금리 전략가는 “최근 목격한 매도 흐름은 미 국채가 더 이상 세계의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체제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신흥 시장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 금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레그 입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최근 중국이 트럼프에 대한 보복으로 보유 미국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부각됐다”며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미국 국채 가격 변동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장기채의 장점이 안정성인 만큼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미국 장기채의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미국 장기채에 상당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국채 가격 급락은 금융 시스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장기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채 가격 급락이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장기 투자를 한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통화 당국에서 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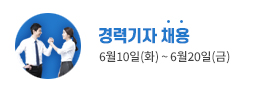








 rok@sedaily.com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