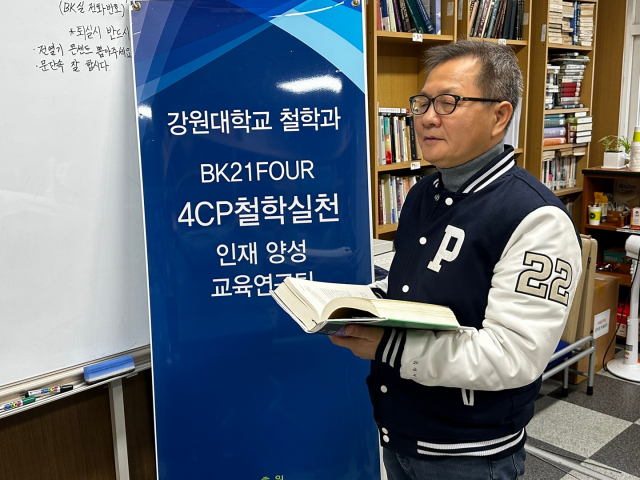“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은 조선 중반 사회를 보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서까래가 썩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극심한 당쟁이 결국 조선을 망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대립과 분열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21세기판 당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율곡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유성선 강원대 철학과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율곡 선생이 지금 사회를 본다면 아예 산으로 들어갈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유 차기 회장은 중앙대에서 동양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강원대 부학장·홍보실장, 중국 저장궁상대·징강산대 방문 교수를 거쳐 한중인문학회장을 지냈다.
유 교수는 율곡 사상의 핵심을 ‘현실 참여와 중용’으로 설명했다. 당쟁이 극심했던 조선 중기, 초야에 묻혀 학문을 쌓았던 퇴계(退溪) 이황(李滉)과는 달리 학문적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한 사회철학자라는 의미다. 그는 “율곡 선생은 당시의 난세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20~30년 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심을 뒀던 실천적 유학자”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상대 당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한 점은 그가 중용의 도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율곡 선생이 유학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철학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도덕경 81장을 40장으로 줄여 필사로 남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성리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고했던 당시에 노자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사문난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였다. 율곡의 제자들이 필사본을 숨겼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에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유 교수는 “유학을 가치로 불교를 논박하고 유가로 노자를 재해석하는 등 학문적 유연함을 보인 인물이 바로 율곡 선생”이라며 “다른 것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존 가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가 보는 율곡 사상의 또 다른 핵심은 ‘교육을 통해 사람의 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악한 것도 교육을 통해 선한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이를 과학기술과의 발전과 결부해 재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AI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악이 될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인간 심성을 선하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율곡이 현대사회에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유 교수는 “과거 자신이 찾아갔던 금강산으로 다시 들어갔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의 발전보다는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고 대화와 타협보다 갈등과 반목만 추구하는 현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아무리 율곡이라도 고개를 내저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과거에는 수신제가(修身齊家)하지 않으면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수신조차 하지 않고 평천하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소모적 당쟁을 일삼았던 조선 중기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