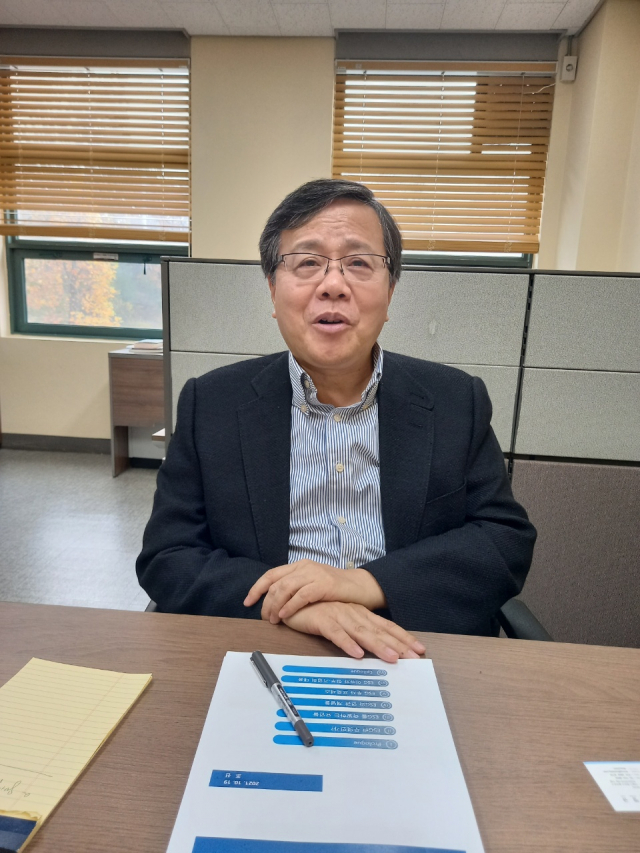“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는 전세계 주요 연기금 500여 곳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130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아주 조그만 소형 자산 운용사 하나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펀드도 다른 펀드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ESG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6월 저서 ‘넥스트 자본주의, ESG’ 발간 후 ESG 전도사로 나선 조신(사진)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신촌캠퍼스 새천년관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ESG에 대한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교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매니징 디렉터,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원장, 글로벌융합기술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1년 6개월 가량 역임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ESG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의 이유을 자본주의의 위기와 기후 변화, 장기 투자자의 등장에서 찾고 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졌고 기후변화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장기 투자자들이 30~50년 뒤의 수익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 보다 장기 이익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최근 만나는 기업마다 ESG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교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자본주의는 본래의 지향점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존재다. 자본주의 궁극의 가치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영속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 극대화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오만해지면서 소비자는 속이는 대상, 근로자는 착취의 대상, 협력 업체는 납품 단가 인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CEO 봉급 삭감과 스톡옵션 장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단기 이익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ESG 기업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식품기업 다농의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실적 악화 탓에 경질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세상에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문제는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의 밸런스(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조 교수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투자자와 금융 기관, 기업, 정부 중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일본만 해도 기후행동 100플러스에 공적연금기금(GPIF)을 비롯해 총 17개가 가입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를 포함해 단 한 곳의 연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ESG 투자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조 교수의 판단이다. 7조5,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ESG펀드 중 상당수가 ‘무늬만 ESG’라는 게 그의 평가다. 정부도 마찬가지. EU의 ESG 관련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데 우리 정부는 2030년에 돼서야 관련 정보 의무 공시가 이뤄진다. 조 교수는 “EU와 비교하면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공시 계획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의 관련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기업들이 ESG 하면 선언 대회나 기업 비전에 반영하면 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며 “진정한 ESG를 하려면 장·단기 이익의 밸런스를 재조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