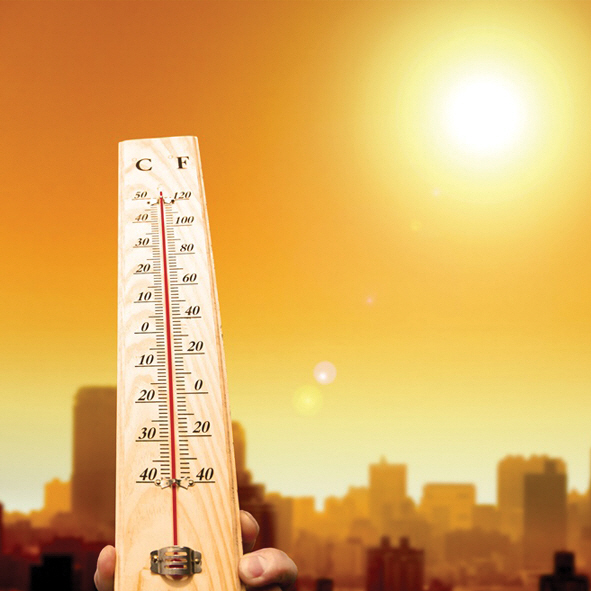2003년 7월 엄청난 더위가 유럽을 휩쓸었다. 뜨거운 고기압 기단이 유럽을 솥뚜껑처럼 덮어 열을 가두는 ‘히트돔(heat-dome)’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기상이변이었다. 상당수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돌았고 밤에도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특히 프랑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원래 7월 평균 기온이 25.8도에 불과했던 오세르의 최고 기온은 41.1도까지 치솟으며 프랑스에서만 1만4,000명 이상이 더위로 목숨을 잃었고 유럽 전역에서는 7만명이나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40도만 해도 이처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구상에는 이보다 더 무더운 지역이 꽤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사이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 내 그린랜드는 1913년 7월10일 낮 최고 기온이 56.7도까지 올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엘아지지아(El-Azizia)라는 곳 역시 1922년 9월13일 50도를 넘었다. 무서운 구제역 바이러스조차 소멸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온이다.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의 여름 폭염도 장난은 아니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국내 최고 기온은 1942년 8월1일 대구의 40도이지만 1944년 8월1일 경북 영주가 이보다 훨씬 높은 46도를 경험했다는 보도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지금이야 집이나 직장·공공시설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잠시라도 무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냉방기기는 꿈도 못 꾸었을 시절. 그저 ‘하드’나 얼음 주스 또는 냉수마찰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를 견디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으리라 추측해본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는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23일에는 주춤했지만 서울의 최고 기온은 22일 38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와 불과 0.4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대로 간다면 최고 기온 기록도 갈아치울 기세다.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는데 땡볕 더위가 얼마나 더 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나마 건강한 청년들이나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덜하지만 쪽방촌이나 노숙자·노년층 같은 취약계층은 살인적인 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고 기온 경신과 같이 쓸데없는 신기록은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송영규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