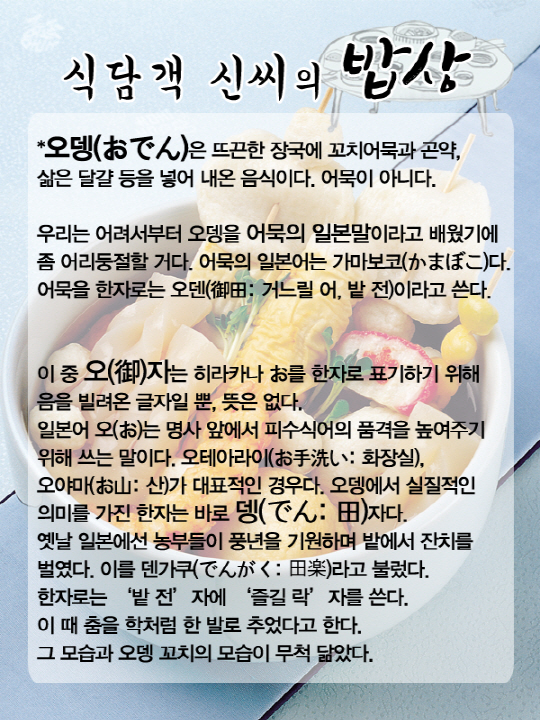호기심 많던 소년이 중년에 접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언어들이 더 궁금해져만 간다. 단어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어느새 옛 추억도 하나 둘 떠오른다. 글쓰기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아저씨. 신문에 본인 칼럼을 연재했고, 만화 스토리도 쓰고 있다. 늘어나는 흰머리만큼이나 호기심도 커져만 간다. 앞으로 ‘식담객’(食談客·음식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그네)이라는 필명으로 서울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맛깔나는 입담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2003년 어느 늦은 가을, 얼마 남지 않은 스물아홉의 밤.
삼성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잔을 나누는 중이었다.
그 날은 동호회에서 극장에 가는 날이었다.
퇴근 후 코엑스 메가박스에 모여 영화를 보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10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예닐곱 젊은 남녀 회원들이 인근 스타벅스로 발걸음을 향했다.
“음~음~”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에 들기름을 두른다.
내세울 건 번들거리는 목소리뿐이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블에 두고, 제사를 지낸다.
난 커피를 싫어한다.
푸른 시절의 남녀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로도 설레기 마련이다.
그런데 좀 어색하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하다.
더듬 더듬 몇 마디를 하는 둥 마는 둥 앉아있다가 먼저 집으로 향하는 길.
“아우야, 한 잔 하자.”
종우 형이다.
동호회에서 만난 세 살 위 회원으로, 큰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지만, 투박한 사내들의 정과 달콤쌉쌀한 소주에 이끌려 이내 친해졌다.
허름한 포장마차의 주황색 포장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가을바람에 겨울내음이 묻어 있다.
바람이 싸늘할수록 소주는 뜨끈하게 식도를 굽이친다.
소주가 달다.
“무슨 일 있어? 항상 쾌활한 사람이 오늘은 시무룩해.”
“아, 좀 멋적어서요. 저 커피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형도 나왔다. 예쁜 애들 놔두고.”
“나중에 내 욕하기 없깁니다!”
맘 맞는 이와 함께하니 술이 맛있다.
이슬이 두 병이나 말라붙었는데, 오돌뼈는 아직 접시에 한 가득이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운치 있다.
아주머니가 석유 난로에 불을 지피신다.
따스한 기운이 올라오며 술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
“홍보란 건 재밌어? 기자들 대하려면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종우형의 말에 빙긋 웃으며 술잔을 비운다.
“행운이죠.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형한테 자기계발서 내용 실습하는 거야?”
“회사원이 되리라곤 생각 안 했어요. 다른 준비 하다가 접고 취업하려니, 학점도 엉망이고 자격증도 하나 없었죠.”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거 보면, 머리가 좋았나?”
“아뇨, 작은 기업에서 시작했어요. 다행히 언론홍보업무가 재밌고 자질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연봉으론 한계가 있더라구요.”
“어떤 한계?”
“대기업이 아니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고 큰소리쳤지만, 연봉 1,600만원과 낯선 회사 이름에 측은해 하더라구요.”
“누가? 니가 좋아한 여자들이?”
어이없어하는 형의 물음에 긴 담배 연기로 대답한다.
“아뇨. 주변 사람들이요.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내색하진 않지만 어머니와 형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술잔을 내밀며 형이 말한다.
“그래도 멋지다. 지금은 좋은 데 다니잖아.”
“운이 많이 좋았어요.”
자리가 무르익는다.
쌓인 술병이 어느덧 네 병이다.
힘겹던 시절 얘기를 거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도 결국엔 여자 얘기다.
스물아홉과 서른둘 청년은 본능에 순종해야 자연스럽다.
“큰 회사 다니니까 좋더라구요. 작년에 여자 좀 소개해 달라니까 못 들은 척 하던 선배 부인을 마주쳤어요. 회사 옮겼다는 소리 들었다고, 자기 후배 소개해 준다고 번호 건네줬어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네.”
“그래도 어머니가 기뻐하셔서 좋아요. 저 때문에 맘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술잔을 부딪치곤 한동안 지난날을 떠올린다.
취기가 밀려오며, 감정도 조금씩 격해지는 것 같다.
형도 말 없이 담배를 꺼내문다.
적막이 흐르자 주변의 소리가 귓가에 닿는다.
“그쪽은 요즘 어때? 인원 조정한다면서?”
우리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저씨들의 이야기다.
짙은 색 정장 차림에, 40대 중반쯤 들어 뵈는 얼굴.
고단하고 담담한 표정이다.
자켓에 부착된 뱃지가 우리 회사 것 같다.
괜스레 반갑다.
“이렇게 될 줄 알았나? IMF에, 구조조정에~ 신입사원 땐 모든 게 다 자신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집은 동네 잔치도 했었어... 그러면 뭐 하나? 애 학원비 내기도 막막한데.”
“그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눈치 보는 머슴살이지 뭐!”
뭔가 억울하다.
영광스런 훈장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느낌이다.
이전 회사에 다닐 때, 어떤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명함을 건넨 기억이 떠오른다.
시간이 지나 바닥에서 맥주에 퉁퉁 불은 명함을 발견했다.
거긴엔 내 이름이 박혀 있었고, 나는 황급히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었다.
“형, 나 저 선배님들께 인사 드리고 올게요.”
“어, 아는 분들이야?”
“아뇨, 그런데 우리 회사 뱃지 달았어요.”
“아이고, 너 취했어. 너네 회사는 동대문이고, 여기는 삼성동이잖아.”
형도 취한 듯하다.
벌떡 일어나 중년 사내들쪽으로 성큼 성큼 다가간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신입사원 OOO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선배님들 말씀 들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선배님들 힘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취했어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먹였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찌글찌글한 상황이야!’
머리가 복잡해지며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온다.
정신없이 달려나가 한참을 게워낸다.
빈 속에 깡술을 붓다시피 한 결과다.
자리로 돌아오니 종우형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저씨들은 보이지 않는다.
“형, 미안해요. 여기 제가 낼게요.”
“계산했다. 다음에 사.”
“죄송합니다. 이제 가셔야죠.”
“안주 하나 나올 거야. 먹고 가자.”
잠시 후, 아주머니가 노란 양은냄비에 뜨끈한 오뎅탕을 내오신다.
파와 고춧가루의 색상이 묘하게 어울린다.
뜨끈한 국물이 해진 속을 달래준다.
꼬치를 하나 들어 어묵을 빼먹으니, 속도 든든하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형이 말한다.
“속 좀 풀리냐? 이건 아까 계시던 그 선배님들이 사주신 거다.”
“어, 진짜? 우리 선배님들 멋지시죠? 부럽죠?”
“응, 참 좋은 선배님들이더라. 그런데 그거 너네 회사 뱃지 아니던데.”
“예? 진짜요...?”
“뭐 어때, 감사히 먹자.”
“후루륵~ 후르륵~”
국물 떠먹는 소리에 정겨운 밤이 깊어간다.
/식담객 analogoldman@naver.com
식담객 신씨는?
학창시절 개그맨과 작가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언론 홍보에 입문, 발칙한 상상과 대담한 도전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어원 풀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업 알리기에 능통한 15년차 기업홍보 전문가. 한겨레신문에서 직장인 컬럼을 연재했고, 한국경제 ‘金과장 李대리’의 기획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PR 전문 매거진 ‘The PR’에서 홍보카툰 ‘ 미스터 홍키호테’의 스토리를 집필 중이며, PR 관련 강연과 기고도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홍보 바닥에서 매운 맛을 본 이들의 이야기 ‘홍보의 辛(초록물고기)’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